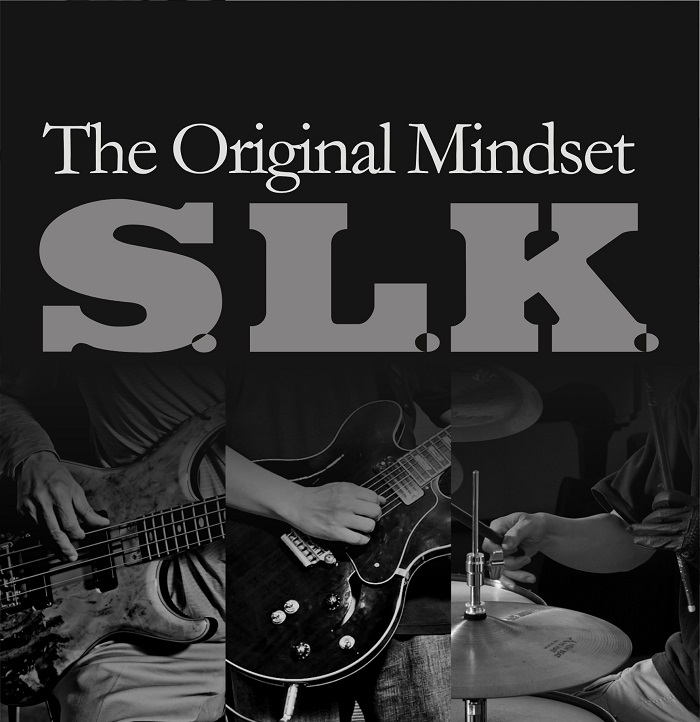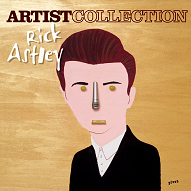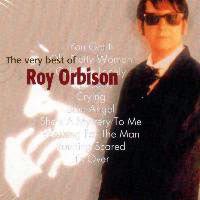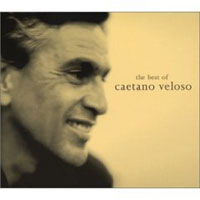|
|
 |
 |
 |
 |
|---|
펜더 로즈의 마스터 데오타토의 걸작 [Whirlwinds].
존 트로피아의 기타와 함께 펼쳐지는 재즈 록 퓨전의 향연.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완벽한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들어 보지 못했다. 데오다토의 음악은 트레디셔널, 클래시컬, 록, 재즈를 완벽하게 융해시켜 새로운 창조물로 우리에게 선사한다.” - 마론 브란도
팬더 로즈의 마스터 데오다토의 걸작
지금은 별로 쓰이지 않지만, 70년대에 자주 쓰였던 악기로 팬더 로즈를 들 수 있다. 초기 일렉트릭 피아노라 할 수 있는데, 신디사이저처럼 여러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톤으로 승부하는 악기다. 5-60년대를 해몬드 올갠이 주름잡았다면, 가히 팬더 로즈는 그 후속 악기로서 퓨전 재즈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존재라 하겠다. 특히, 마일즈 데이비스는 이 악기 톤을 매우 좋아해서 자신의 밴드에 허비 행콕, 키스 재릿 등에게 이 악기를 연주하게 했고, 그 결과
필자는 퓨전 재즈에 그리 큰 관심은 없지만, 70년대 초까지 이어진 대가들의 왕성한 실험은 높이 사는 편이다. 마일즈로 시작된 그 계보는 웨더 리포트, 해드헌터스, 리턴 투 포에버 등으로 이어지는데, 공교롭게도 이들 모두 팬더 로즈를 키보드로 쓰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 크루세이더스의 조 샘플부터 밥 제임스, 조지 듀크, 로니 리스턴 스미스, 브라이언 오거 등 화려한 면면이 떠오른다. 그러나 이 모든 리스트의 제일 앞줄에 데오다토를 집어넣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 사실 그의 음악은 컨템포러리 재즈나 퓨전 재즈에 넣기엔 뭐한 감이 있다. 예전엔 아트 록 듣는 매니아들 사이에서 데오다토가 언급되기도 했지만 그쪽 계보는 결코 아니다. 단순하게 크로스오버 정도로 언급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그의 존재감이 너무 크다. 그의 히트작은 1972년에 발표한
왜 이렇게 팬더 로즈에 대해 설명하냐면, 마치 카잘스와 바하, 세고비아와 기타의 관계처럼 이 악기와 데오다토의 숙명적인 만남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운드를 가만히 음미해보면, 놀랍게도 요즘 한참 유행중인 라운지나 엠비언트 등과 묘한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 면에서 70년대 초 데오다토의 출현은 당대를 넘어선 뭔가 획기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필자의 취향을 하나 덧붙이자면, 데오다토의 출생이 주는 이국적인 면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 그는 순수 브라질 태생의 뮤지션이다. 그리고 그의 초기 경력엔 보사 노바 재즈를 수없이 편곡하고, 어렌지한 일로 채워져 있다. 그런데 그런 브라질리언 테이스트를 필자는 좋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같은 퓨전이라고 해도, 밥 제임스나 조지 듀크 등엔 난색을 표하지만, 데오다토엔 왠지 점수가 가는 것이다.
데오다토의 배경을 좀 더 언급하면, 그는 1944년 6월 22일, 브라질의 리오에서 출생했다. 틴 에이저 시절에 전공은 엔지니어링이었지만, 워낙 음악을 좋아해 록 밴드에도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다 17살 때 우연히 어느 오케스트라의 어렌지를 담당하면서 재능을 보인 결과, 빠르게 스튜디오를 전전하며 여러 형태의 음악을 어렌지하는 프로로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그의 나이 스물 셋이 되었을 땐, 이미 브라질 뮤지션으로서 미국에서 성공한 루이스 본파라는 기타리스트가 그 소문을 듣고 초청하게 된다. 이래서 대망의 미국 땅을 밟은 데오다토는 곧 크리드 테일러가 주관하는 CTI의 멤버가 되어 여러 뮤지션들의 음반 작업을 도맡아하게 된다. 그 중엔 웨스 몽고메리의
데오다토가 뮤지션으로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는 70년대에서 80년대 초라고 할 만하다. 그중 핵심을 꼽는다면 오히려 데뷔 시절의 CTI가 아니라, 74년부터 76년까지 무려 다섯 매의 앨범을 내놓은 MCA 시절이라 하겠다. 이 무렵 그의 테크닉과 감각은 가히 절정이라 할 만해서, 다채로운 장르를 넘나들면서도 그 특유의 브라질리언 필링과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 시대를 초월하는 감각 등이 결부되어 지금 들어도 신선한 느낌을 준다. 아마 홍대나 강남의 멋진 바에서 이런 음악을 틀면, 최근에 꽤 재능있는 뮤지션이 나왔구나, 하는 평을 들을 법도 할 것이다. 그런 MCA 시절의 스타트를 끊는 앨범이 바로 본 작인 것이다.
이 앨범엔 총 여섯 곡이 수록되어 있는데, 난삽하다 할 정도로 여러 장르의 음악이 혼재되어 있다. 스윙 시대의 무드 있는 댄스곡부터 클래식 소품, 퓨전 재즈, 록, 쿠바 음악 등 각각의 곡들이 분명한 콘셉트를 갖고 있고, 이것들이 굴비 엮듯 줄줄이 흘러나오는데 결코 산만하지는 않다. 아마 전반적인 어렌지와 리더를 담당하고 있는 데오다토와 리드 기타를 맡고 있는 존 트로페아의 호흡이 착착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닐까 싶다.
오프닝으로 나오는 "Moonlight Serenade"는 글렌 밀러 불후의 명작. 이것이 70년대에 오면 어떤 식으로 연주되는가 흥미있게 지켜볼 곡이다. 매우 화려하면서도 다양한 악기들이 서로 엇갈리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낭만적인 톤이 유지되는 것은 마치 40년대 빅 밴드의 70년대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악단을 리드하면서 유려하게 솔로를 펼치는 데오다토의 연주는 매우 인상적이다. 이어지는 두 곡에선 사실 별다른 감흥을 받지 못했다. 그 후, LP로 치면 4번째 곡부터 사이드 B로 넘어가는 셈인데, 이때부터 본 편이 시작된다. 우선 언급할 만한 곡이 “West 42nd Street"와 타이틀 넘버 ”Whirlwinds"다. 모두 장대하게 구성된 대곡 스타일이고, 그 중간에 큐바 재즈풍의 “Havana Strut"가 끼어있는데,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곡이라 보면 된다. 우선 4번째 트랙부터 보면, 본 작에서 가장 데오다토의 맛이 철철 넘치는 작품이라 하겠다. 콩가라던가 봉고, 퍼커션, 드럼 등 타악기들이 다채롭게 엮인 가운데 대규모 편성의 현악과 관악이 동원되고, 그 위에 이펙트를 잔뜩 집어넣은 기타 솔로가 펼쳐지면서 데오다토는 특유의 톤으로 팬더 로즈를 연주한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는 듯하다 중간부터 점차 사이즈가 커져서 매우 장중한 오케스트라를 방불케한다. 이런 밀려오는 듯한 압박감은 요즘 크로스오버에선 결코 맛볼 수 없는 무게감을 갖고 있다. 마지막 곡 역시 타이틀 트랙답게 스케일이 엄청난데, 당시 미국 음악계를 주름잡던 어스 윈드 앤 파이어나 슬라이 앤 패밀리스톤 풍의, 매우 펑키하면서도 가뿐하게 펼쳐지는 리듬감이며, 온갖 악기들이 동원되서 불협화음을 연상시킬 정도로 화려하게 얽히는 대목은 가히 탄성을 자아낼 만하다. 그야말로 어렌저로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데오다토의 솜씨가 십분 발휘된 작품이며, 후련한 엔딩이라 하겠다.
한편 80년대부터 데오다토의 행보는 뮤지션이라기보다는 편곡자에 가까운 행보로 일관한다. 그런 면에서는 초기 뮤지션으로 출발했다가 어렌저로 대성한 퀸시 존스를 연상케도 한다. 80년대 초에 특히 쿨 앤 더 갱이라는 밴드를 집중적으로 백업해서 차트를 강타한 일도 있지만, 한 동안 그의 이름을 뮤직 씬에서 찾아보기 힘들었다. 90년대에 와서 그는 놀랍게도 월가의 증권 딜러로 활약하는, 일종의 비즈니스맨의 풍모를 보여주기도 한다. 음악과 증권 브로크는 가히 상극이라 할 만도 하다. 한쪽이 장발에다 수염을 덕지덕지 기른 모습이라면, 이쪽은 쫙 빼입은 슈트와 브리프 케이스 아닌가 ? 참, 그의 변신엔 어떤 한계도 없는 모양이다.
그러다가 일본인들에게 쇼킹한 사건이 하나 벌어진다. 90년대 중반, 파리에 등장한 클레몬틴이라는 미녀 샹송 가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이 여성이 이상하게도 일본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바 있다. 그런데 그녀의 앨범을 프로듀스하고 또 몇 곡은 직접 편곡까지 한 인물이 데오다토인 것이다 ! 어디 그뿐인가 ? 비요크라는 전위적인 여가수의 앨범
 |
 |
 |
 |
|---|
2. Ave Maria
3. Do It Again
4. West 42nd Street
5. Havana Strut
6. Whirlwinds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