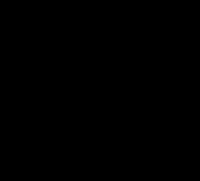|
|
 |
 |
 |
 |
|---|
리스너들의 끊이지 않는 요청 속에 화제의 재발매!!
Coming to terms + 4EPs (repackage)
Arco ‘꿈속에서 소리 내기 시작하는 침묵' 음악소리는 말소리처럼 침묵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병행한다. 음악소리는 마치 침묵의 표면을 굴러가는 것 같다. 음악은 침묵이다. 꿈속에서 소리 내기 시작하는 침묵이다. 음악의 마지막 소리가 사라진 다음 보다 침묵이 더 잘 들릴 때는 결코 없다. - 막스 피카르트
'꿈속에서 소리 내기 시작하는 침묵' 이라는 저 인용구처럼 arco의 소속레이블은 Dreamy records이다. 그들은 꿈을 꾸듯 음악을 만들 뿐 아니라 둥지마저 꿈의 얼개로 얼기설기 엮어 놓았다. 물론 영미권에서 발원된 수많은 드림팝 밴드들이 꿈을 착취한 방식과 arco가 꿈이란 좀비를 다시 호명하는 것이 그리 달라 보이진 않는다. 또 곡의 결들마다 저미는 골방적 정서, 좀더 작아지고 작아져서 사람들 바깥으로 숨고 싶어하는 로트레아몽 컴플렉스적인 태도가 드림팝퍼나 슈게이저들에겐 일용할 양식이자,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씹는다는 핀란드 껌과 다를 바 없어 보인다. 다만, arco가 국적불명의 꿈속으로 망명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의 꿈을 대하는 태도는 어디서 기인하는 것인가? 이들의 음의 기원을 발굴하기 위해선 고고학적 단서인 ‘꿈’을 굴착기로 파내야 한다. 꿈의 여러 파편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그들의 곡을 곡진하게 듣고, 더듬더듬 꿈결과 음악 사이의 엉겨붙음을, 그 친화력의 연원을 솎아 내야 한다. arco를 다시 유령처럼 불러내 다시 그들의 꿈속으로 잠입해 들어갔다.
그들에 관한, 그들의 음악에 대한 영미 프레스의 여러 글들을 훑어보았다. US Popwatch에선 트위팝의 본산 Sarah record의 여러 밴드들 The Orchids, The Field Mice를 언급한다.특히, 영국 프레스에선 Nick Drake, Belle & Sebastian, Radiohead와 앞서 말했던 영국산 트위팝 밴드들을 열거해 나가고 있다. 미국 프레스들 역시, 'American music club', 'Low', 'Red house painters' 등을 나열하느라 바쁘다. 아무래도 자국 중심적인 취사선택이지만 영미 공히 졸음의 기원이나, 졸음의 음악적 도정에서 봇짐을 고쳐 맨 도플 갱어(Doppelganger)들만, 짜고 치는 고스톱마냥 읊어 대고 있다. 그들 즉, 해외 유수의 프레스들은 누구나, arco란 초짜 밴드는 졸음에 겨워 홀린 듯한 극소량의 음들을 토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샘플러 유행을 일궈 낸 CMJ에선 ‘opium dream'이란 사운드의 중독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결국 여기서 arco는 다시 꿈과 조우한다. 아편장이의 치명적인 꿈이긴 하지만. 여러 프레스의 글을 읽다보면, 일일히 언급하기 뭐하게 sleep, lullaby, dream이란 단어들이 리뷰의 중심부에 포진하고 있다. 항용 수면을 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단어들만 골라 뽑은 듯한 이 단어들의 연쇄는, 음악을 듣기 전에 음악과 동침한 느낌이 들 지경이다. 수면과 자장가와 꿈의 이 삼위일체는 arco를 설명하는 설득력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첫 문턱 ‘speak'에서는 기타의 울림통 사이로 새어나오는 chris healey의 예의 소곤거리는 음성으로 ‘how can i speak?'라고 이 앨범의 화두를 던진다. 그리고 이내 소통의 불가능을 나지막하게 진술한다. 취조자인 사운드텍스처는 계속 미니멀한 무드를 반복한다. 다시 다음 소절에서 불현듯 ‘how can i live?'란 비약이 던져진다. 소통 불가능한 현실의 담담한 토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생의 실존으로 비약한다. 그들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는 삶의 활기를 생매장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렇게 그들은 커뮤니케이션과 삶의 불가능한 접선을 동일한 사운드텍스처 속에 가둬 놓는다. 여기서 그들의 침묵은 또아리를 틀고, ‘여기는 감옥이야 여
기는 빠져 나올 수 없어’란 체념의 정서가 주눅든 chris healey의 음성에 담겨지게 된다. 그들의 음악에는 법석대는 음들의 속성이 말끔히 거세당한 채, 고스란히 밀봉되어 있다. 마치 침묵을 강요당해 침묵의 표면을 굴러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음악처럼 들린다. 다른 곡들도 거의 동일한 음성과 무드로 음들을 침묵 속에 포박하고 있다. 자, 그 포박된 침묵의 소리들을 열거해 보자. 이 앨범의 대표곡 중 하나인 ‘alien'은 영미권에 발원된 루저들의 송가로 적절한 텍스트이다. 그러나 Radiohead의 'creep'처럼 노이즈의 광풍이 휘몰아치는 것도 아니고 Beck의 'Loser'처럼 위악적인 유머가 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존재의 투기도 어떤 아이러니를 노리는 위악적 컨셉도 없다. 그저 그들은 숫기 없이 ‘i feel like an alien' 이라고 웅얼거릴 따름이다. 그들의 음악 저변엔 체념의 정서만이 어둠이라는 휘장처럼 깔려 있다.
'20000 ft'의 순결 콤플렉스를 자극하는 오르간 연주, 마치 고해성사를 앞에 둔 소년의 상기된 볼 같다. ‘No-one at the wheel'에서 음과 음 사이의 헐거운 틈 사이로 이명처럼 들리는 하모니카 소리와 ‘sleep'에서 잠결에 들리는 듯한 새 울음 샘플은 아침을 부르는 소리가 아닌 온전히 꿈속으로 망명을 떠나라는 신호음 같다. 앨범의 고갱이인 ‘all this world'에 가선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마치 체념의 정서가 확신으로 옮아 간 듯하다. 흐느낌에 푹 절여진 듯한 Ebow Guitar와 피아노가 라인의 맥을 짚으면 베이스 드럼이 보컬을 위무한다.
그리고 일몰의 느낌을 담은 오르간의 출렁거림이 이내 어쿠스틱 기타와 일렉기타의 스트러밍로 대체된다. 그런 여러 악기들의 묵묵한 고행의 행적은 “얼마나 새로운 만남이 필요할까?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마주하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나누어야 할까? 이 세상 가득히 당신이 혼자임을 깨닫기 위해선(how many strangers d'you have to meet?/how many old friends d'you have to see?/with how many lovers d'you have to sleep?/ to know that you're alone/in all this world)"" 라는 클라이막스에 와선 그들의 체념이 확신에 가까워지고 이내 Ebow Guitar와 피아노의 반복되는 후주, 다시 음들의 처연한 프롤로그로 복귀한다. 마치 잔여물인 음들을 밀어내고 남은 말간 침묵을 게워내듯.
그래서 그들은 첫 데뷔 앨범의 마지막 곡명을 ‘lullaby'로 정한 것이 아닐까? 가사에서 밝혀지듯, 그들은 지금 안식을 바라고 잠을 자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한다. 그 노력에 진심이 담겨 있음은 곡 후반부 그들에겐 유래가 없는 코러스의 축복이 증명해 주고 있다. 결국 현실인 세계, 말이 통하지 않는 이곳을 탈출해서 종착역인 꿈의 골방에 무사히 이르고 싶은 소망이 그 코러스에 담겨 있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단절로 자신을 ‘alien'으로 몰아간 세상과 멀어져 완전무결한 꿈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이다. 꿈의 세계는 꿈과 침묵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뱀처럼 엉켜 있는 곳이다. 인용 그대로 ‘꿈속에서 소리 내기 시작하는 침묵'이다. 요컨대 침묵만이 존재하는 그 곳에 홀로 잠들고 싶은 것이다. 거기서 다시 ‘꿈'결같다는 클리쉐가 침묵과 조우하게 된다. 꿈결같다는 즉, 바슐라르 식으로 말하면 몽상은 깨어서 하는 꿈이니까, 그런 몽상적이란 수사가 arco의 음악엔 적절하다.
그런 생짜의 감정을 듣고 난 황망함이란, 다시 서둘러 플레이 버튼을 누르기엔 어떤 감정의 찌꺼기가 미처 걸러지지 않고 있다. 아무런 야심도 없는 음악, 온통 소통 불가능한 감정의 파편들만을 주워 삼키며, 그 감정의 올곧음을 제스처나 폼으로 위장하지 않는 음악, 이 진솔한 자폐 증세는 어디서 기원하는 것일까? 앞에서 해외 유수의 프레스들이 손가락 꼽던 밴드들이 arco를 이해하는
키워드일까? 적어도 사운드상 정서는 Radiohead와 비슷하다. 그래서 이젠 장르명으로도 통용되는 adioheadism이란 치마폭으로 감싸면 그들을 이해하는 것은 한결 쉬워진다. 그러나 그들의 자폐적인 정서에는 톰요크같은 무당적 신기나, 주술적 광기, 음악적 난봉질은 없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이 처한 곤궁한 세상에 주눅들 따름이다. 현실도피적인 기질이랄까, 어디 세상과 절연된 동굴 속에서 쑥과 마늘로 연명하며 만든 음악 같다는 생각까지 들게 한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미학적 야심도 없고 더군다나 세상을 바꿀 송가를 만들려는 이상도 없다. 그저 도피하고 싶어서 세상의 이면, 꿈의 골방 속으로 망명을 떠난 것이다. 결국 그들의 곡에서 도처에 출몰하는 dream, sleep이란 단어는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키워드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웠고 다시 저 인용구처럼 자진해서 ‘꿈속에서 소리 내기 시작하는 침묵'속으로 침잠해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의 음악에서는 낯가림의 발원지 Sarah record의 여러 밴드들과 70년대 영국 포크음악의 유산이 감지된다. 가령 ‘movie'같은 트랙의 고색창연한 스트링은 슬픔이란 정서가 툭 불거질 뿐만 아니라, 영국 포크의 오래된 유산 속으로 퇴행하고 싶은 욕구가 담겨 있다. 싱어송라이터의 세계, 즉 히피 세대의 슬로건 이후 자족적인 우주에 머물며 내적 독백만 변주하던 그 싱어송라이터들의 후예 중 하나가 arco이다.
답답하다. 단지 꿈꾸듯 잠들고 싶어하는 그들의 도피성 발언의 행방은 결국 침묵의 꼬리를 물고늘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은 ‘all this world'란 병 속에 홀로 밀봉되었음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경악하는 대신 체념을 선택한다. 즉, 체념이 침묵의 가면 ‘Persona'인 것을 안다, 아니 차라리 수긍한다. 왜냐면 그들의 음악은 안다고, 이해한다고, 만들어지는 음악이 아니니까. 단지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세상살이의 신산스러움에 대해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 할 뿐이다. 그런 조건반사가 그들의 체념을 최소의 음과 음성 사이에서 숨박꼭질 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숨고 싶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최소의 음과 음성으로 꿈을 꾸듯 침묵하고 싶은 것이다. 물론 어떤 음악인들 안다고 이해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앞에 열거한 그 정서의 조건반사로 인해 무장해제하는 음악이 이들의 음악이란 생각이 든다. 그래서 그런 음악들을 통칭해서 슬로코어 ‘slowcore'라고 명명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계속 꿈과 침묵이란 단어 속에서 허우적대는 이 리뷰의 말장난 같은 동어반복도, 그들의 음이 결국 도돌이표처럼 폐곡선을 그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말을 줄이고 싶은 욕망이 음악을 낳게 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그 욕망에 순진할 정도로 충실한 것이다. 그런 arco적 세계관을 뭐라 명명해야 하나? 아니 무슨 의미를 둘 수 있을까?
꾸물거리는 동안 엄습하는 슬픔의 정서가 체념의 정서이며 그 체념의 정서의 종착역이 꿈이라니! 현실도피가 삶의 한 방법이라는 그 도저한 절망이 답답하고 먹먹하다. arco는 침묵해야만 음악이 곁을 내 준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깨달은 듯하다. 그래서 그 무의식의 세계, 꿈의 공간에, 음악이란 살갗을 비비고 있다. 음악을 듣는 내내, 아니 음결의 살갗에 몸을 비빌 무렵부터 음악은 침묵 속에서 숨을 몰아 쉰다는 걸 그들은 직감적으로 알아냈다. 귀를 바짝 밀착해야만 들을 수 있는, 마치 옹아리하는 아가처럼 들릴락 말락하는 음성으로 arco는 잦아든다. 마침내 그 잦아드는 소리마저 가청권 밖으로 사라지면 남은 침묵의 검은 덩어리가 듣는 나를 옥죄는 걸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 그들의 음악은 그렇게 절명한 것이다! 아무런 저항감 없이, 무기력하게 음들은 난파당하고 나는 황망하게 다시 음들의 파편이 침묵의 덩어리 구석구석 마다 박혀 있길 바라며 플레이 버튼을 누른다. 절명한 음들의 유령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 다시 불러내 첫 리스닝의 감흥을 다시 짜 맞추려고 한다. 허나 음들이 명멸한 다음 내 몸을
휘감는 침묵의 적요함만이 나를 위무해 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 결국 침묵만이 내 곁에서 오랫동안 벗이 돼 준다. 바로 그 깨달음을 arco는 꿈결이란 클리세로 침묵에 화답하는 것이 아닐까.
 |
 |
 |
 |
|---|
1. Speak
2. Alien
3. Flight
4. Driving At Night
5. Babies' Eyes
6. Accident
7. Movie
8. Grey
9. Into Blue
10. All This World
11. Lullaby
[CD-2]
1. Distant Lies
2. 20000ft
3. Sleep
4. Cry
5. No-One At The Wheel
6. Lie
7. Someone Else
8. Here
9. At Least
10. Doubts Remain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