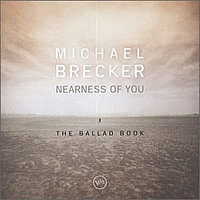|
 |
 |
 |
|---|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매일의 새벽과 황혼도 도이터에게는 고귀한 축복인가보다. 스스로를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은둔자’라 표현하는 이 명상음악의 거장은 달이 구름 뒤로 숨고, 별빛이 발하고 사라지는 찰나까지 붙잡아 영원함으로 승화시키려 한다. 신디사이저 위에 빚어진 타블라와 하프의 선율은 그 만의 자연음으로 다시 태어나고 또 나지막한 침묵으로 순환한다. 도이터의 음악은 여전히 온기 가득한 자연과 생명을 머금고 있다. 그 따뜻함이야 말로 그가 음악인, 또 한 인간으로서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
 |
 |
 |
|---|
1. Dammerschein
2. East Of The Full Moon
3. Vibrant Dusk
4. Moon-Silvered Clouds
5. Marfa Lights 1
6. 0Black Velvet Flirt
7. Earth Shadow
8. Marfa Lights 2
9. Dawn Shimmer
2. East Of The Full Moon
3. Vibrant Dusk
4. Moon-Silvered Clouds
5. Marfa Lights 1
6. 0Black Velvet Flirt
7. Earth Shadow
8. Marfa Lights 2
9. Dawn Shimmer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