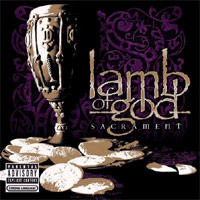|
 |
 |
 |
|---|
4년 만에 다시 트리오로 돌아온 우리 시대의 재즈 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의 피아노 트리오 새앨범!
Brad Mehldau Trio
당대 재즈 피아노 트리오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 역작! 확고한 스타일의 구축 이를 더욱 단단하게 다져가는 우리 시대 거장의 행보 이제 재즈 팬들에게 브래드 멜다우는 가장 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뮤지션 중 한 명이자, 뭔가 새로운 이슈가 생겨날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저널의 관심을 받는 보기 드문 존재가 되었다.
그 유명세가 여느 셀레브리티 같은 말초적이고 가십성의 것이 당연히 아님을 재즈 팬들이라면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확실히 그가 새로운 레코딩을 발표하거나 다른 프로젝트로 투어를 시작하는 것은 그게 어떤 편성이든, 이젠 재즈 신의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될 만큼 팬들과 관계자의 주목을 받고 또 기사로 다루어진다.
재즈 아티스트로서 그는 그만큼 신뢰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그것도 아주 크게. 그가 90년대 초 뉴욕 재즈 신에 등장했을 때 함께 주목받았던 일군의 젊고 유망한 피아니스트들 가운데 한명에 불과했던 존재감이, 지금처럼 거장의 아우라가 느껴질만큼 독보적인 존재로까지 성장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업적인 마케팅과 지속적인 홍보이상으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이 바로 그의 음악 자체에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기이하게 느껴질만큼 독창적인 피아노 음색과 터치, 브래드 멜다우임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는 프레이즈의 전개, 테마의 구성, 작곡 기법 등 그의 스타일을 결정짓는 이런 요소들은 지난 90년대 초 데뷔 이후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20여년 지난 지금 더욱 공고해졌고, 완성도가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져가고 있다.
이 점은 그의 음악을 다른 피아니스트들과 확실히 구별 짓는 잣대이자 중요한 매력 포인트와 개성을 넘어 성공 요인이 된 것이다. 여기에서 좀 더 들어가 보자면 테크닉 적으로나 기법적인 면에서나 아주 높은 수준과 난이도를 갖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대중적인 성향을 가진 멜로디 메이커로서의 재능도 함께 갖추고 있어 감상자를 아주 곤혹스럽게 하지는 않는 친절한 면도 내재하고 있음을 아울러 이야기하고 싶다.
- 아! 물론 이는 현 재즈 신에서 활동하는 다른 뮤지션들의 음악과 비교해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지 리스닝 하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그것도 곡에 따라 편차가 크게 있으며 제프 발라드와 함께 한 이후의 트리오 작품들은 더욱 더 복잡하고 만만치 않은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 그리고 필자가 이전 브래드 멜다우 작품들의 라이너 노트와 관련 기사를 쓰면서 언급한 바 있지만, 그의 음악적 기반이 당대의 트렌드와 흐름에 적합한 면이 있다는 점은 확실히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그에겐 아주 수준 높고 복잡한 레벨의 기술을 갖춘 연주자들에서만 가능한 피아니즘이 자리 잡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시대에 부합하는 감성과 멜로디 메이커로서의 능력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오리지널뿐만 아니라 라디오헤드나 폴 사이먼, 닉 드레이크, 오아시스와 사운드가든 너바나 같은 유명 팝/록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종종 가져와 이를 해석하는 것에서도 이런 성향을 읽어낼 수 있는데, 그가 선택하는 곡들이 얼핏 보기에 의도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자극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바라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재해석이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리티가 강하게 베어 나오며 마치 자신의 작품같이 느껴질만큼 음악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강하게 밀착되어 있는 경우처럼 느껴진다.
이는 그 자신이 애초 이 뮤지션들의 음악에 깊은 애정과 공감대를 갖고 있었으며 그 곡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결코 대중들의 시선만을 염두에 둔 의도로 선택하고 시도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베토벤, 브람스와 말러 같은 평소 그가 존경해 마지 않는 클래식 작곡가의 작품에서 기인하는 특징, 그리고 윈튼 켈리와 주니어 맨스, 프레드 허쉬와 케니 워너 같은 선배와 스승들에게서 습득한 정통적인 재즈 이디엄, 그리고 이러한 팝적인 감각, 이 세 가지는 피아니스트 브래드 멜다우 이전에 뮤지션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가장 큰 축이자 근간이 되며 이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내부에 융화되어 그의 음악이 만들어져 왔다는 사실은 필자가 이전부터 이야기 해온 바이며, 그의 팬들이라면 다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한다.
게다가 그는 생각 이상으로 상당히 부지런하고, 또 꾸준하기도 하다. 실제 그의 성격과 이미지를 보았을 때 이는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면이기도 한데, 그와 협연앨범을 발표한 바 있는 팻 메시니처럼 아주 열정적이고 일중독자처럼 비춰질만큼 에너지 넘치는 그런 외향적인 캐릭터와는 거리가 멀지만 대신 정말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재즈 신에서 활동해왔으며, 1995년 워너를 통해 첫 메이저 데뷔작인
지금까지 활동해오면서 발표한 작품들이 공동 리더작과 프레쉬 사운드 레이블의 레코딩을 포함해 총 30장이 되는데 -사이드 맨으로 참여한 음반 제외- 20년 정도의 활동기간 동안 이 정도의 앨범을 발표한 것도 그렇지만 이 앨범들이 모두 꾸준하고 기복 없는 작품성을 유지하는 지속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대단하다.
특히 최근 그의 활동량과 행보는 한창 때의 팻 메시니를 방불케 하는 데 2010년부터 올해까지 단 2년 여 사이에 그는, 무려 5장의 관련 앨범을 연이어 발표하는 왕성한 창작력을 과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 앨범들 중 단 한 장도 과거 음원들을 다시 정리한 것은 없다.
-그나마 작년 발표된 두장 짜리 라이브가 2006년도 녹음이다. 또한 최근 The Art of the Trio 시절을 정리한 박스 셋은 제외하고 이야기하는 것임을 염두에 두시길 바란다- 성악가 안네 소피 본 오터와의 듀오작
물론 브래드 멜다우 뿐만 아니더라도 실력과 유명세를 겸비한 일류급 연주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일년 내내 연주 스케줄이 빡빡하게 잡혀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하지만 그렇게 공연을 하고 동료 뮤지션의 서포트를 해주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앨범을 이렇게 계속 발매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일이다. 아무리 다양한 뮤지션들과 함께 긱(Gig)을 벌인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면 컨셉도 준비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기본적으로 창작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같은 초일류들은 앨범을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그 내용이 흡족하지 않은 경우가 보이면 결코 허투루 발매하지 않는다. 혹여나 음반사와 계약문제가 얽혀 일정 기간 내에 몇 장의 음반을 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모를까, 하지만 수십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고를 기록하는 팝 아티스트도 아닌 재즈 뮤지션에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으며 브래드 멜다우 역시 그런 조건으로 넌서치 레이블과 계약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결과물들은 순전히 그가 원했던 프로젝트이며 또 그 결과물이 어느 정도 스스로에게도 납득이 되는 레벨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덧붙이자면 앞서 언급한 작품들은 모두 하나같이 일정이상의 성과를 거둔 수작들이었으며 평단의 평가 역시 나빴던 적이 없었다. 최근 그의 기량과 창작력에 물이 올랐음을 증명하는 바가 아닐까 싶다. 신작으로 발표되는
그리고 2005년작
그러니까 ‘Countdown’ 이나 ‘All The Things You Are’ 같은 스탠더드 넘버도 없고, ‘Exit Music’ 이나 ‘Wonderwall’, ‘Riverman’ 같은 팝 넘버가 따로 리메이크 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레퍼토리상 이목을 끌만한 이슈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신 수록 곡들 중 몇몇은 동료 뮤지션들을 위해 바치는 추모의 의미로 만들어져 있으며, 심지어는 가공의 인물을 기리며 쓴 작품도 담겨져 있어 제법 흥미롭게 보인다. 그런 이유로 앨범 타이틀이 송가로 붙여지게 된 것이다.
“이 앨범은 특별히 저의 팀 메이트인 제프 발라드와 래리 그래나디어, 그리고 저 이렇게 트리오를 위해 만든 곡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별다른 치장 섞인 말 대신 연주로서 제가 의미를 두고 특별히 생각해왔던 사람과 가상의 인물들에게 헌사와 추모를 바치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 앨범은 바로 그들에게 바치는 송가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인 ‘M.B’ 는 색소포니스트 고(考) 마이클 브레커를 위해 만든 곡이며, ‘Kurt Vibe’ 는 저의 동료이자 절친한 친우인 기타리스트 커트 로젠윙클을 위해 썼습니다. 그리고 영화
그 캐릭터가 브래드 멜다우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상을 주었기에 이렇게 곡까지 썼는지는 확인 된 바 없지만 직접 곡까지 작곡해 앨범에 수록할 정도라면 아마도 적잖지 않게 감화된 면이 있으리라. 아무튼 전체 11개의 오리지널들은 별다른 설명이 필요없이 인트로의 시작음과 몇 소절의 테마만으로도 브래드 멜다우의 음악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뚜렷하고 선명한 사운드를 드러낸다. 여전한 그 특유의 마이너 멜로디 운용을 통해 표현해내는 감성은 이젠 친숙하게 다가오며, 오랜 친구의 목소리를 듣는 듯 반갑기까지 하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브래드 멜다우가 그동안 전작들을 통해 보여줬던 특징들. 이를테면 왼손의 과감하고도 독특한 사용과 콤핑, 스트레이트한 스윙, 비밥과 더불어 록적인 비트의 사용으로 훨씬 풍부해진 리듬의 운용, 그만의 피아노 터치와 프레이즈가 확고하고도 단호하게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거침없이 표현해낸다.
이채로운 블루스와 스윙 리듬의 조합으로 그간 브래드 멜다우의 음반에서 쉬이 접해보지 못했던 ‘Bee Blues’나 도발적으로 느껴질만큼 공격적이고 프리한 접근을 시도한 ‘Wyatt's Eulogy for George Hanson’ 같은 곡이 색다른 맛을 주기도 하지만 그 외 나머지 트랙은 두말할 나위없이 그에게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음악들이다. 연주의 완성도와 표현력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다.
그간 이들의 음악에 귀 기울여 온 팬들이라면 굳이 트랙마다 시시콜콜한 설명을 늘어놓지 않더라도 필자의 말에 공감할 것이다. 이만큼 검증된 기량을 갖춘 세 명의 연주자들이 자신들만의 고유함, 여기에 팀 워크까지 갖추고서 이렇게 꾸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은 그 자체만으로 고정된 레귤러 트리오가 흔치 않아진 현 재즈 신에 훌륭한 귀감이 된다. 이번 신작을 통해 이들은 다시 한번 자신의 커리어에 의미 있는 결과물을 남겼으며 팬들과 평론가들은 이들 트리오의 음악에 더욱 더 탄탄한 신뢰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확고하고 또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멜다우이즘(Mehldauism)이라는 신조어를 쓰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필자는 이전
이번 앨범은 그런 예상이 결코 오판이 아니었음을 훌륭하게 증명해준다. 마흔 초반의 나이에 멜다우이즘이라는 단어를 써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자신의 영역을 구축하고 이를 지탱해나가는 젊은 대가의 행보!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흥분된다.
글:
 |
 |
 |
 |
|---|
2. Ode_6:20
3. 26_7:50
4. Dream Sketch_7:25
5. Bee Blues_6:42
6. Twiggy_5:42
7. Kurt Vibe_4:54
8. Stan the Man_5:24
9. WWyatt’s Eulogy for George Hanson_9:23
10. Aquaman_4:49
11. Days of Dilbert Delaney_9:01
Brad Mehldau, piano
Larry Grenadier, bass
Jeff Ballard, drums
Produced by Brad Mehldau
All songs composed by Brad Mehldau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