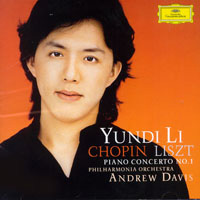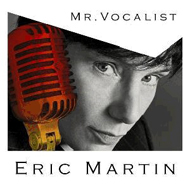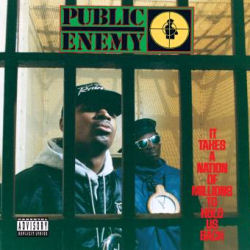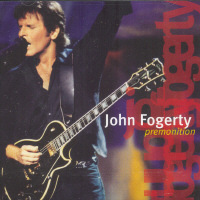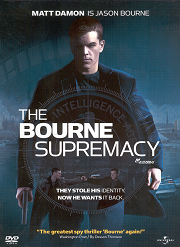|
|
 |
 |
 |
 |
|---|
로열 헌트의 전성기 시절을 대표하는 라이브 명반 [1996]
로열 헌트가 가진 국내에서의 지명도란, (멜로딕메틀이라는 장르에 한정해) 이제 애써 밴드에 대한 부연 설명을 달아놓지 않아도 될 정도로 누구에게나 익숙한 ‘기분’이 되었다. 덕분에 로열 헌트의 앨범은 데뷔작 [Land Of Broken Hearts](1993)을 제외하면, 현재 모든 정규앨범을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상황이며, 여기에 약간의 수고를 더한다면 멤버들의 솔로앨범까지 손에 넣을 수 있는 지경이 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로열 헌트의 팬들은 무언가 허전한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코스요리를 나오는 대로 모두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가 부르지 않는 허전함. 그래서 생각해보니 무언가 중간에 음식 하나가 빠진 것 같은 기분 말이다. 만약, 로열 헌트를 코스요리로 가정하고 지금까지 차근차근 발매되었던 앨범들을 그 주된 음식으로 생각한다면, 라이브 앨범 [1996] 역시 이 코스요리에 절대 빠져서는 안될 음식이 될 것이다.
로열 헌트는 멜로딕메틀 계열에서 중견급에 속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비교적 많은 수의 앨범을 냈으며, 이는 각각 몇 가지 성향으로 나누어진다. 크게 본다면 총 세 가지 갈래로 이들의 음악이 나눠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 로열 헌트의 사운드 변화상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을 위해 여기서 간략히 짚어보도록 하자.
1기 : 초대 보컬리스트인 Henrik Brockmann 재직시의 1기 로열 헌트는 [Land Of Broken Hearts]와 [Clown In The Mirror]로 대표되는데, 이 때는 멜로디 라인 위주의 바로크메틀 혹은 네오 클래시컬 어프로치의 멜로딕메틀을 추구하고 있으며, 비교적 짧은 러닝타임으로 단아한 느낌을 강조한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로열 헌트 특유의 악곡은 이미 이 때부터 재현되고 있으며, 사운트퀼리티 상의 문제만 제외한다면 그리 흠잡을 구석이 없다.
‘Running Wild’, ‘Easy Rider’, ‘Fight’, ‘Age Gone Wild’, ‘One By One’, ‘Stranded’, ‘Wasted Time’, ‘On The Run’, ‘Clown In The Mirror’, ‘Here Today, Gone Tomorrow’, ‘Epilogue’ 등의 대표곡을 발표하였다.
2기 : 로열 헌트의 최전성기 시절이라 말할 수 있는 때로 맑은 중음과 고음을 잘 살린 보컬리스트 D.C. Cooper 가 활약하였다. 이 때의 앨범으로는 [Moving Target]과 [Paradox]를 꼽을 수 있는데, 1기와의 차이점이라면 키보드의 음군(音群)이 사운드의 여백을 가득 채워버려 보다 화려한 악곡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여기에 보다 탄탄한 구성은 물론 멜로디에 있어서도 발전된 형식을 취하고 있어, 모든 면에서 진일보한 느낌이다. ‘Last Goodbye’, ‘1348’, ‘Far Away’, ‘Time’, ‘Tearing Down The World’, ‘Message To God’, ‘Time Will Tell’, ‘It’s Over’ 등의 히트곡을 양산하였다.
3기 : 아텐션(Artension)의 보컬리스트 John West 를 맞이하여 밴드의 새 출발을 알린 시기로, 멜로딕메틀 고유의 특성에서 벗어나 프로그레시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강조하였다. 국내에 ‘본격적’으로 로열 헌트의 이름을 알린 [Fear]와 [The Mission]이 여기에 속하는 작품인데, 보다 현대적인 질감과 세련된 구성으로 기존까지 이들이 쌓아왔던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밴드의 핵이라 할 수 있는 Andre Andersen의 키보드 음색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인 듯. ‘Fear’, ‘Lies’, ‘Follow Me’, ‘Voices’, ‘The Mission’, ‘Surrender’, ‘World Wide War’ 등이 사랑받았다.
로열 헌트 멤버들은 솔로활동을 통해 밴드와 별개의 음악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키보디스트인 앙드레 앤더슨과 보컬리스트인 존 웨스트, 디씨 쿠퍼의 앨범을 꼽을 쑤 있는데, 앙드레 앤더슨의 경우 로열 헌트의 작곡을 맡고 있는 중심 멤버이다 보니 솔로작도 밴드의 앨범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특히, 앙드레 앤더슨의 솔로앨범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그가 각각의 로열 헌트 앨범을 제작할 당시에 가장 크게 심취해 있던 부분이 무엇인지 솔로작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점인데, 즉 [Paradox]와 [Fear]mf 발표할 당시에는 드라마틱하고 프로그레시브한 성향의 대곡들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고 이는 첫 번째 솔로앨범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가장 최근작인 [The Mission]에 와서 다시 한 번 바뀌어 이제 현대적인 질감의 음색-인더스트리얼과 같은 일렉트로니카 사운드-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 그의 두 번째 솔로앨범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앙드레 앤더슨의 솔로활동은 로열 헌트와 결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로열 헌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그의 솔로앨범만큼은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 된다. 한편, 이에 반해 존 웨스트와 디씨 쿠퍼의 앨범은 로열 헌트와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추고 있는데, 즉 이들은 보다 정통 헤비메틀에 근접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존 웨스트는 창법자체가 메틀 보컬리스트의 것에서 발전한 타입이기 때문에 그런 음색에 걸 맞는 정통적인 음악을 선보이며, 디씨 쿠퍼는 허스키를 되도록 배제한다는 특성 때문에 멜로디를 잘 살린 음악을 선사한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자신의 작품이든 남이 만들어준 작품이든, 두 보컬리스트의 노래실력에 한참 못 미치는 작곡력이 솔로앨범의 단점으로 작용하여 전체적으로 그다지 근 임팩트를 줄만한 작품은 못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자, 지금까지 로열 헌트의 이모저모에 대해 살펴봤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더블 라이브 앨범 [1996]에 대해 알아보자. 이 앨범은 타이틀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1996년 일본에서 가진 라이브 음원으로 제작된 것이다. 당시 밴드는 [Moving Target]을 발표한 직후였기 때문에 3집을 중심으로 공연을 가졌으며, 이는 [1996]의 수록곡만 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고, 여기에 [Land Of Broken Hearts]와 [Clown In The Mirror] 수록곡도 다수 선곡되어 있어, 과거 헨릭 브룩만이 불렀던 부분까지 새롭게 채색되어졌다는 특징이 있다. 세 장의 앨범에서 고르게 선별한 수록곡과 각 멤버들의 솔로연주까지 포함한 리스트 때문인지, 이 라이브앨범은 두 장의 CD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열 헌트의 전성기를 총정리하는 성격까지 지니고 있다. 그러나, 정규앨범이 아닌 만큼 각 수록곡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일일이 덧붙이는 것은 구차한 일이라고 생각되며, 대신 전제적인 방향성에 대해 언급해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보통 락 밴드의 라이브앨범으로는, 스튜디오 앨범에서 느낄 수 없는 현장감과 즉흥성, 관중과의 교감 등을 잘 살린 작품이 있는가 하면, 스튜디오 앨범과 거의 다름없는 정교한 연주력으로 곡을 더욱 탄탄하게 재현해내는 작품이 있는데, 이 앨범은 후자의 경우에 근접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재현’에 경직되었다는 인상보다는, 적절한 해석과 (관중과의) 교감이 덧씌워진 형태를 취하고 있어, 라이브앨범으로서의 현장감도 잘 살려내고 있다. 특히, 출중한 테크닉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각자 튀기보다는 밴드에 충실한 연주를 펼치고 있어 중용의 미덕이 무엇인지, 그리고 밴드로서의 화합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게다가, 원곡보다 더 높은 완성도로 곡을 재해석해 놓은 디씨 쿠퍼의 보컬은 각각의 곡이 가진 분위기에 따라 변화무쌍하게 변화하여, 로열 헌트의 아름다운 멜로디 라인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로열 헌트가 최근에 와서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이들의 음악을 사랑하던 골수팬에게 다소 실망감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지만, 밴드는 이에 아랑곳 않고 나름대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로열 헌트의 1년 후, 10년 후 모습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바뀔지 현재로서는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대신 이들이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떠올리며 추억에 빠지는 일은 수월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로열 헌트의 전성기를 그리워하며 그 감동의 카타르시스를 전해주는 매개체로 [1996]이 당당히 꼽혀야함은, 로열 헌트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
 |
 |
 |
|---|
[CD-1]
1. Flight
2. 1348
3. Wasted Time
4. Stay Down
5. On The Run
6. Stranded
7. Keyboard Solo
8. Martial Arts
9. Far Away
10. Last Goodbye
11. Land Of Broken Hearts
12. Makin' A Mess
[CD-2]
1. Clown In The Mirror
2. Guitar Solo
3. Step By Step
4. Drums And Bass Solo
5. Running Wild
6. Epilogue
7. Age Gone Wild
8. Ten To Life
9. Legion Of The Damned
10. Kingdom Dark
11. Time
12. Bad Luck
1. Flight
2. 1348
3. Wasted Time
4. Stay Down
5. On The Run
6. Stranded
7. Keyboard Solo
8. Martial Arts
9. Far Away
10. Last Goodbye
11. Land Of Broken Hearts
12. Makin' A Mess
[CD-2]
1. Clown In The Mirror
2. Guitar Solo
3. Step By Step
4. Drums And Bass Solo
5. Running Wild
6. Epilogue
7. Age Gone Wild
8. Ten To Life
9. Legion Of The Damned
10. Kingdom Dark
11. Time
12. Bad Luck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