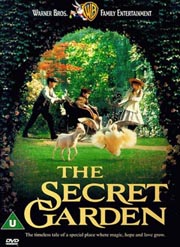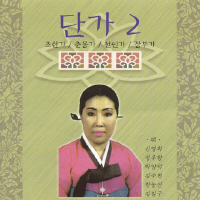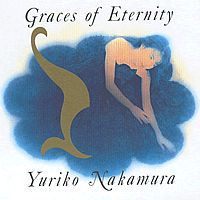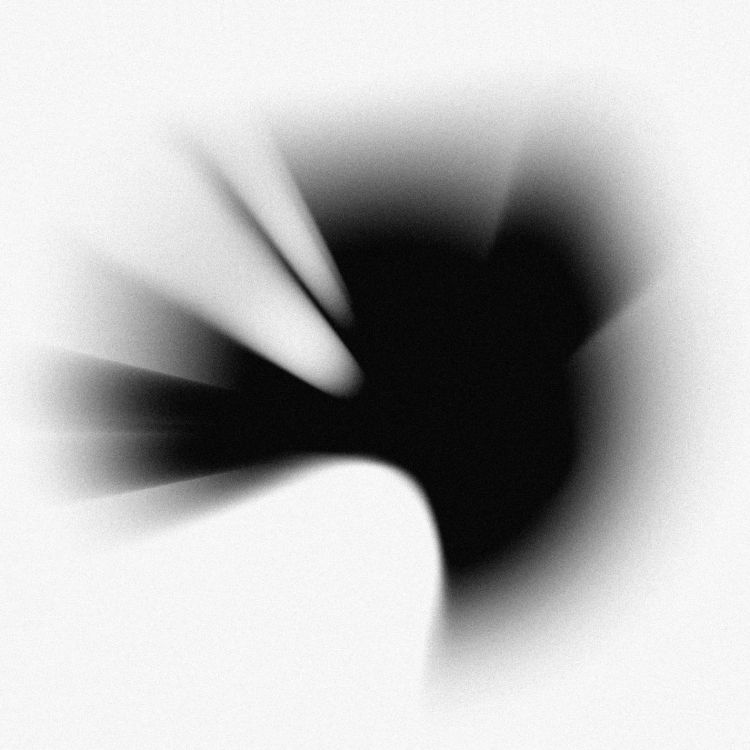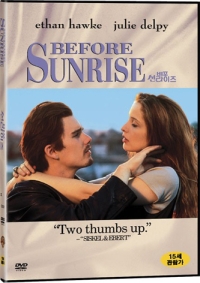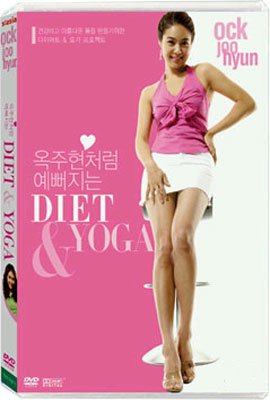|
|
 |
 |
 |
 |
|---|
잉베이의 초기 음악이 다른 헤비 메탈 밴드들과 전혀 다르게 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작곡의 과정에 있었다. 세상의 거의 모든 밴드들(기타리스트가 프론트맨이라 하더라도)은 곡을 만들 때 보컬 파트의 멜로디를 먼저 만든다. 그리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에서 기타와 나머지 파트의 멜로디를 그린다. 하지만 잉베이가 만드는 곡은 애초부터 인간의 목소리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기타의 멜로디 라인에서부터 출발한다. 오직 그의 기타만이 더듬을 수 있는 음표들의 틈바구니에 어찌어찌 틈을 내어 보컬 파트를 집어넣지만 윤곽이 드러날 리가 없다. 초대 보컬리스트였던 제프 스코트 소토(Jeff Scott Soto)의 보컬이 어딘가 주눅 들어보였던 건 결코 그의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었다. 이런 작곡 방식은 세 번째 앨범이었던 [Trilogy]에서 정점을 이룬다. 대부분의 그의 팬들이 기억하는 잉베이 최고의 순간을 이 때로 칠 만큼 당시의 그는 가장 빨랐고, 가장 화려했다. 이런 방식은 조 린 터너(Joe Lynn Turner)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달라진다. 이 백전노장의 보컬리스트는 잉베이 외의 멤버로는 처음 작곡에 참여했고, ‘Dreaming’을 비롯한 몇몇 곡을 보컬 멜로디가 중심이 되게 만들었다. 잉베이의 음악에서 비로소 인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데에는 이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숨결과 초인적인 테크닉 사이의 균형은 앨범 [Seventh Sign]까지 이어졌다.
잉베이의 음악이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한 건 좀 안 된 얘기지만 1994년, [Pony Canyon]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부터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즈음 그런지 이외의 록은 모두 구닥다리 취급을 받으며 초토화되던 시기였는데, 북유럽 출신의 이 기타리스트에게 처음부터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미국 시장은 그를 완전히 외면했다. 이적 후 잉베이는 그가 원했건 아니건 어쨌든 일본을 주 활동무대로 삼았고, 알다시피 잉베이의 이후 행적은 최악이었다. 특유의 우아함은 자취를 감췄고, 이것저것 한 마디로 잡스러운 시도를 하며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잃어갔다. 결정적으로 멜로디는 아름다움을 놓쳤으며 도대체 무얼 들려주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치러진 몇 번의 내한 공연에서 만난 잉베이는 20대의 미끈한 청년이 아니라 뚱보 아저씨일 뿐이었다. 다만 기타 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오직 꾸준한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잉베이는 21세기의 첫 해에 부활한다.
지난 해 '일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은 지금껏 수많은 밴드가 시도했으나 미완에 그쳤던 록과 클래식의 크로스오버의 완료형 명제였다. 잉베이는 자신을 잊었던 세상을 향해 결코 시들지않은 음악적 열정을 보여주었고, 기타가 왜 '작은오케스트라'라고 불려지는지를 증명하였다. 그 작업은결과적으로 잉베이에게 잊고 있었던 바로크에 대한 감각을 되살려주었고, 헤비 메탈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십 몇 년 전의 영감이 넘치던 시절을 다시 한 번 엿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2002년 잉베이는 앨범 [Attack]으로 제 2의 전성기를 실현하고자 한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력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격적인 기타 플레이로 가득 차 있는 앨범 [Attack]은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잉베이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음악의 정수를 담고 있다.
때로는 사납게, 때로는 부드럽고 소박하게 완급을 조절하며 전개되는 73분의 러닝타임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 장담한다. 이를테면 이것은 감격적인 해후이다. 당신은 대다수의 록 애호가들이 그런지로 투항해버린 후 헤비 메탈은 촌스럽다고 비아냥대던 동안에도, 잉베이가 상업성에 매몰되어 자신의스타일을 잃었다고 비난받을 때도, 지난 몇 년 잉베이가 황당한 앨범을 들고 나와 정신이 나갔음을 스스로 보여주던그시기에도 이 혁명적이고 천재적인, 무엇보다도 음악에 대한 성실함으로는 사상 최고임을 인정받은 기타리스트에게 미련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나이로 마흔줄에 접어든 이 성실한 천재는 자신의 전성기였던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에 들려주었던 그 환상적인 사운드를 되살려내며, 그것으로 기어이 무저갱 같은 슬럼프의 터널에서 탈출하였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그의 플레이가 증명하듯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사상 최강이고, 그의 가슴은 세월의 흐름과 그가 그 동안 겪었던 고통 속에 훨씬 깊어졌으며 그것들은 고스란히 이번 앨범에 투영되어 있다.
붉은 색 바탕에 (잉베이의 것으로 짐작되는) 제법 예쁜 눈동자 하나. [Seventh Sign] 이래 가장 파격적인 자켓만이 눈에 띌 뿐, 일단 앨범의 외형만을 놓고 보면 전작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마이애미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였고, 프로듀싱은 잉베이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고 믹싱은 저명한 엔지니어인 톰 플레쳐가 담당한 점이 그나마 눈에 띈다. 여타 잉베이의 앨범과 마찬가지로 이번 앨범에서도 잉베이는 기타, 배킹 보컬, 베이스 심지어 ‘Freedom Isn't Free’에서는 친히 그 걸쭉한 목소리로 리드 보컬마저 자임하고 나섰다. (자신이 작곡한 곡을 자신이 직접 부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잉베이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키보드를 맡은 데렉 쉐레니안(Derek Sherinian)이다. 키스(Kiss)의 투어 멤버였으며 앨리스 쿠퍼(Alice Cooper)와 드림 씨어터(Dream Theater)의 정식 키보드 주자였던 그가 잉베이의 밴드에 합류한 건 [War to end All wars] 남미 투어에서부터였다. 이번 앨범에서 그의 연주의 대부분은 기타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딥 퍼플(Deep Purple)의 리치 블랙모어(Rich Blackmore)와 존 로드(John Lord)가 그랬던 것처럼 잉베이의 기타와 똑 같은 멜로디 라인을 훑어가며 트윈 기타가 존재할 수 없는 밴드(세상에 누가 잉베이와 똑같은 연주를 할 수 있단 말인가!)에서 또 하나의 기타의 몫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드럼은 스웨덴 북부 출신의 패트릭 요한슨(Patrik Johansson)이 맡았는데, 그 역시 데렉과 같은 시기에 밴드에 합류했다. 그는 그의 전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타의 진퇴에 보조를 맞추며 잉베이가 원하는 것만 연주하고 있으며,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레인보우(Rainbow)의 96년 앨범 [Stranger in Us All]에서 보컬을 맡았던 두기 화이트(Dougie White)는 참여 멤버 중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준다. 마치 마크 볼즈(Mark Boals)와 마이크 베세라(Mike Vescera)를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는 역대 파트너중 잉베이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음색을 가지고 있다.앨범을 듣고 난 이후의 느낌을 먼저 말하자면 이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멤버들 중 단연 최강이다.
16개의 트랙들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3곡의 인스트루멘탈인데, 그것들 중 ‘Baroque & Roll’이 거둔 음악적 성취는 내가 아는 한 잉베이가 거둔 가장 빛나는 것이다. 클래식과 록이 이 곡에서만큼 완벽한 조화를 이뤘던 적은 감히 없었다. 특히 곡의 중간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데렉과 잉베이의 주고받는 플레이는 단순하면서도 극명하게 잉베이의 진수를 들여다보게 만든다.(심지어 데렉의 키보드는 하프시코드의 음색이다.) 슬로우 템포의 ‘Majestic Blue’는 제목만큼이나 우아하고 기품 있는 픽킹 플레이를 들려주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만 더 단순하게 만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보너스 트랙을 제외한 마지막 곡인 ‘Air’는 그 동안 잉베이가 곡의 중간중간에 즐겨 삽입했던 바흐의 ‘G 선상의 아리아’를 완전한 인스트루멘탈로 만든 것이다. 마치 쳄발로와 하프시코드의 이중주를 듣는 느낌이 들 만큼 스윕 피킹을 거의배제한 채 깔끔하고 선명하게 멜로디 라인을 뜯어가는 모습에서 연륜이 더해준 음악적 깊이를 실감한다.
첫 곡 ‘Razor Eater’의 인트로에서부터 잉베이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타줄을 후린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애드립을 섞어가며 뿜어내는 기타의 향연은 그가 이 앨범을 왜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Rise Up’에서는 한 술 더 뜬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의 손가락은 5연음, 7연음, 9연음, 다시 7연음으로 정신없이 천변만화하며 리듬을 전개해나간다. 그것을 쫓아가는 드러머가 대단하다 싶을 정도인데, 이 천재적인 박자 분할 능력은 잉베이를 그저 정박만 연주할 줄 아는 다른 속주 플레이어와 근본적으로 차이를 짓게 하는 부분이다. 비발디를 연상하게 하는 프레이즈를 전개하는 ‘Ship of Fools’에 이어 등장하는 타이틀곡 ‘Attack’은 시종일관 저돌적으로 내달린다. 그 어떤 스피드 메탈 밴드도 결코 흉내내지 못 할 스피드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운드는 앨범의 컨셉과 함께 잉베이의 본령을 새삼 깨닫게 한다. 지미 헨드릭스의 리프와 사운드 톤을 차용하고 있는 ‘Stronghold’는 80년대 헤비 메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미친 개처럼 질주하는 ‘Mad Dog’은 ‘Attack’만큼이나 도발적인 프레이즈로 진행된다. 전술한 것처럼 잉베이가 리드보컬을 맡은 ‘Freedom Isn`t Free’은 그에게선 좀체 듣기 힘든 블루지를 가득 담고 있으며 그 특이함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다. 잉베이는 그저 빨리 달릴 줄만 안다고 비난했던 이들에게 좋은 반박 자료가 될 듯 싶다. ‘Valhalla’는 귀에 잘 감기는 트랙이다. 조금 더 쉽고 반복적인 프레이즈를 사용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아마 그랬다면 전성기 시절 잉베이의 애창곡으로 남은 ‘Heaven Tonight’이나 ‘I'm a Viking’의 뒤를 이을 수 있었지 싶다.(앨범 전체를 통틀어 그런 곡이 선뜻 눈에 안 띄는 게 조금은 섭섭하다.) 앨범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인트로를 가지고 있는 ‘Touch the Sky’는 두기의 멜로디컬한 보컬이 빛나는 인상적인 곡이다.
[자료제공: 포니캐년, 최종필]
잉베이의 음악이 방향을 잃고 비틀거리기 시작한 건 좀 안 된 얘기지만 1994년, [Pony Canyon]으로 소속을 옮기면서 부터다. 모두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즈음 그런지 이외의 록은 모두 구닥다리 취급을 받으며 초토화되던 시기였는데, 북유럽 출신의 이 기타리스트에게 처음부터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던 미국 시장은 그를 완전히 외면했다. 이적 후 잉베이는 그가 원했건 아니건 어쨌든 일본을 주 활동무대로 삼았고, 알다시피 잉베이의 이후 행적은 최악이었다. 특유의 우아함은 자취를 감췄고, 이것저것 한 마디로 잡스러운 시도를 하며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잃어갔다. 결정적으로 멜로디는 아름다움을 놓쳤으며 도대체 무얼 들려주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치러진 몇 번의 내한 공연에서 만난 잉베이는 20대의 미끈한 청년이 아니라 뚱보 아저씨일 뿐이었다. 다만 기타 플레이어로서의 능력은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었다. 오직 꾸준한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줄 알았던 잉베이는 21세기의 첫 해에 부활한다.
지난 해 '일본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의 협연은 지금껏 수많은 밴드가 시도했으나 미완에 그쳤던 록과 클래식의 크로스오버의 완료형 명제였다. 잉베이는 자신을 잊었던 세상을 향해 결코 시들지않은 음악적 열정을 보여주었고, 기타가 왜 '작은오케스트라'라고 불려지는지를 증명하였다. 그 작업은결과적으로 잉베이에게 잊고 있었던 바로크에 대한 감각을 되살려주었고, 헤비 메탈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십 몇 년 전의 영감이 넘치던 시절을 다시 한 번 엿보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2002년 잉베이는 앨범 [Attack]으로 제 2의 전성기를 실현하고자 한다.
아름답고, 우아하고, 매력적인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격적인 기타 플레이로 가득 차 있는 앨범 [Attack]은 지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잉베이가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음악의 정수를 담고 있다.
때로는 사납게, 때로는 부드럽고 소박하게 완급을 조절하며 전개되는 73분의 러닝타임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 장담한다. 이를테면 이것은 감격적인 해후이다. 당신은 대다수의 록 애호가들이 그런지로 투항해버린 후 헤비 메탈은 촌스럽다고 비아냥대던 동안에도, 잉베이가 상업성에 매몰되어 자신의스타일을 잃었다고 비난받을 때도, 지난 몇 년 잉베이가 황당한 앨범을 들고 나와 정신이 나갔음을 스스로 보여주던그시기에도 이 혁명적이고 천재적인, 무엇보다도 음악에 대한 성실함으로는 사상 최고임을 인정받은 기타리스트에게 미련을 거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해 우리 나이로 마흔줄에 접어든 이 성실한 천재는 자신의 전성기였던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에 들려주었던 그 환상적인 사운드를 되살려내며, 그것으로 기어이 무저갱 같은 슬럼프의 터널에서 탈출하였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그의 플레이가 증명하듯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사상 최강이고, 그의 가슴은 세월의 흐름과 그가 그 동안 겪었던 고통 속에 훨씬 깊어졌으며 그것들은 고스란히 이번 앨범에 투영되어 있다.
붉은 색 바탕에 (잉베이의 것으로 짐작되는) 제법 예쁜 눈동자 하나. [Seventh Sign] 이래 가장 파격적인 자켓만이 눈에 띌 뿐, 일단 앨범의 외형만을 놓고 보면 전작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어 보인다. 마이애미에 있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녹음하였고, 프로듀싱은 잉베이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고 믹싱은 저명한 엔지니어인 톰 플레쳐가 담당한 점이 그나마 눈에 띈다. 여타 잉베이의 앨범과 마찬가지로 이번 앨범에서도 잉베이는 기타, 배킹 보컬, 베이스 심지어 ‘Freedom Isn't Free’에서는 친히 그 걸쭉한 목소리로 리드 보컬마저 자임하고 나섰다. (자신이 작곡한 곡을 자신이 직접 부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잉베이를 제외한 나머지 멤버들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키보드를 맡은 데렉 쉐레니안(Derek Sherinian)이다. 키스(Kiss)의 투어 멤버였으며 앨리스 쿠퍼(Alice Cooper)와 드림 씨어터(Dream Theater)의 정식 키보드 주자였던 그가 잉베이의 밴드에 합류한 건 [War to end All wars] 남미 투어에서부터였다. 이번 앨범에서 그의 연주의 대부분은 기타에 묻혀서 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부분에선 딥 퍼플(Deep Purple)의 리치 블랙모어(Rich Blackmore)와 존 로드(John Lord)가 그랬던 것처럼 잉베이의 기타와 똑 같은 멜로디 라인을 훑어가며 트윈 기타가 존재할 수 없는 밴드(세상에 누가 잉베이와 똑같은 연주를 할 수 있단 말인가!)에서 또 하나의 기타의 몫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드럼은 스웨덴 북부 출신의 패트릭 요한슨(Patrik Johansson)이 맡았는데, 그 역시 데렉과 같은 시기에 밴드에 합류했다. 그는 그의 전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타의 진퇴에 보조를 맞추며 잉베이가 원하는 것만 연주하고 있으며,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레인보우(Rainbow)의 96년 앨범 [Stranger in Us All]에서 보컬을 맡았던 두기 화이트(Dougie White)는 참여 멤버 중 가장 두드러진 활약을 보여준다. 마치 마크 볼즈(Mark Boals)와 마이크 베세라(Mike Vescera)를 섞어놓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는 역대 파트너중 잉베이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음색을 가지고 있다.앨범을 듣고 난 이후의 느낌을 먼저 말하자면 이들은 최근 몇 년 사이 멤버들 중 단연 최강이다.
16개의 트랙들 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은 어쩔 수 없이 3곡의 인스트루멘탈인데, 그것들 중 ‘Baroque & Roll’이 거둔 음악적 성취는 내가 아는 한 잉베이가 거둔 가장 빛나는 것이다. 클래식과 록이 이 곡에서만큼 완벽한 조화를 이뤘던 적은 감히 없었다. 특히 곡의 중간에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데렉과 잉베이의 주고받는 플레이는 단순하면서도 극명하게 잉베이의 진수를 들여다보게 만든다.(심지어 데렉의 키보드는 하프시코드의 음색이다.) 슬로우 템포의 ‘Majestic Blue’는 제목만큼이나 우아하고 기품 있는 픽킹 플레이를 들려주고 있는데, 오히려 조금만 더 단순하게 만들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보너스 트랙을 제외한 마지막 곡인 ‘Air’는 그 동안 잉베이가 곡의 중간중간에 즐겨 삽입했던 바흐의 ‘G 선상의 아리아’를 완전한 인스트루멘탈로 만든 것이다. 마치 쳄발로와 하프시코드의 이중주를 듣는 느낌이 들 만큼 스윕 피킹을 거의배제한 채 깔끔하고 선명하게 멜로디 라인을 뜯어가는 모습에서 연륜이 더해준 음악적 깊이를 실감한다.
첫 곡 ‘Razor Eater’의 인트로에서부터 잉베이는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기타줄을 후린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진 애드립을 섞어가며 뿜어내는 기타의 향연은 그가 이 앨범을 왜 만들었는지를 보여준다. 이어지는 ‘Rise Up’에서는 한 술 더 뜬다.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의 손가락은 5연음, 7연음, 9연음, 다시 7연음으로 정신없이 천변만화하며 리듬을 전개해나간다. 그것을 쫓아가는 드러머가 대단하다 싶을 정도인데, 이 천재적인 박자 분할 능력은 잉베이를 그저 정박만 연주할 줄 아는 다른 속주 플레이어와 근본적으로 차이를 짓게 하는 부분이다. 비발디를 연상하게 하는 프레이즈를 전개하는 ‘Ship of Fools’에 이어 등장하는 타이틀곡 ‘Attack’은 시종일관 저돌적으로 내달린다. 그 어떤 스피드 메탈 밴드도 결코 흉내내지 못 할 스피드로 쏟아져 들어오는 사운드는 앨범의 컨셉과 함께 잉베이의 본령을 새삼 깨닫게 한다. 지미 헨드릭스의 리프와 사운드 톤을 차용하고 있는 ‘Stronghold’는 80년대 헤비 메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미친 개처럼 질주하는 ‘Mad Dog’은 ‘Attack’만큼이나 도발적인 프레이즈로 진행된다. 전술한 것처럼 잉베이가 리드보컬을 맡은 ‘Freedom Isn`t Free’은 그에게선 좀체 듣기 힘든 블루지를 가득 담고 있으며 그 특이함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다. 잉베이는 그저 빨리 달릴 줄만 안다고 비난했던 이들에게 좋은 반박 자료가 될 듯 싶다. ‘Valhalla’는 귀에 잘 감기는 트랙이다. 조금 더 쉽고 반복적인 프레이즈를 사용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아마 그랬다면 전성기 시절 잉베이의 애창곡으로 남은 ‘Heaven Tonight’이나 ‘I'm a Viking’의 뒤를 이을 수 있었지 싶다.(앨범 전체를 통틀어 그런 곡이 선뜻 눈에 안 띄는 게 조금은 섭섭하다.) 앨범을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인트로를 가지고 있는 ‘Touch the Sky’는 두기의 멜로디컬한 보컬이 빛나는 인상적인 곡이다.
[자료제공: 포니캐년, 최종필]
 |
 |
 |
 |
|---|
1. Razor Eater
2. Rise Up
3. Valley Of Kings
4. Ship Of Fools
5. Attack
6. Baroque And Roll (Instrumental)
7. Stronghold
8. Mad Dog
9. In The Name Of God
10. Freedom Isnt Free
11. Majestic Blue (Instrumental)
12. Valhalia
13. Touch The Sky
14. Iron Clad
15. Air (Instrumental)
16. Nobodys Fool (Bonus Track)
2. Rise Up
3. Valley Of Kings
4. Ship Of Fools
5. Attack
6. Baroque And Roll (Instrumental)
7. Stronghold
8. Mad Dog
9. In The Name Of God
10. Freedom Isnt Free
11. Majestic Blue (Instrumental)
12. Valhalia
13. Touch The Sky
14. Iron Clad
15. Air (Instrumental)
16. Nobodys Fool (Bonus Track)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