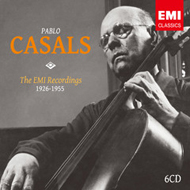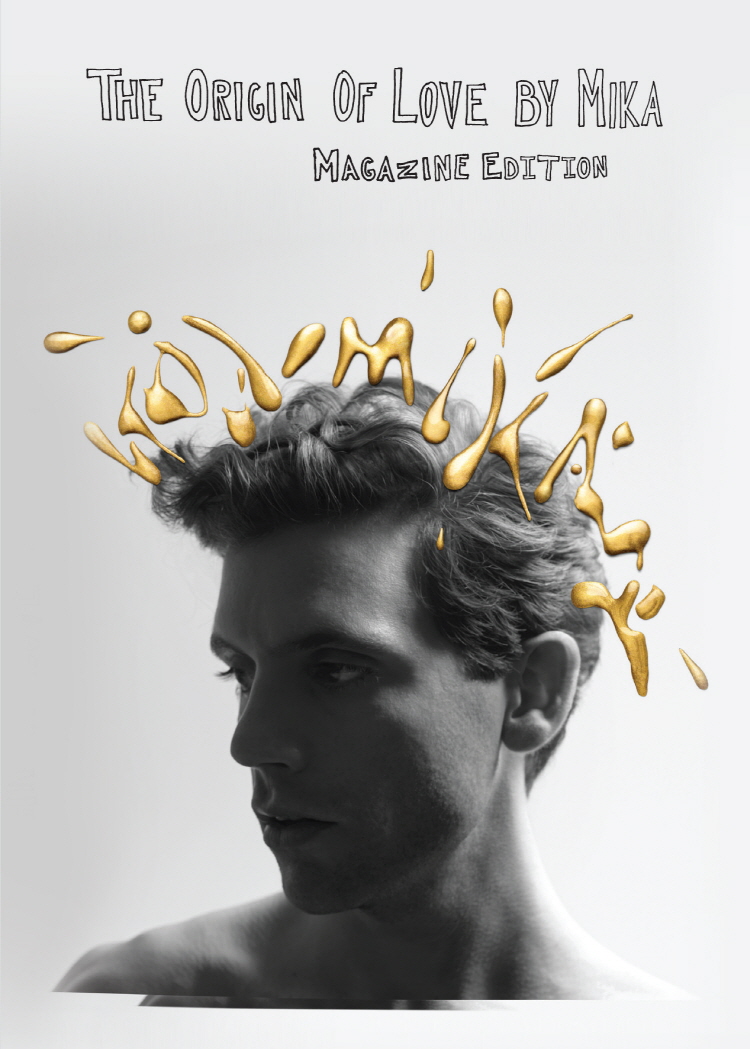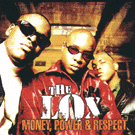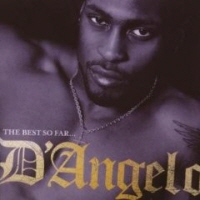|
|
 |
 |
 |
 |
|---|
노래를 삼키는 굉음
스웨덴을 넘어 유럽전역으로 뻗어나가는 쓸쓸하지만 아름다운 어둠의 멜로디
포스트록 밴드 피지 로스트(pg.lost)의 씬을 뒤흔든 In Never Out(2009)
장르의 구분, 혹은 신조어 개발 같은 것이 평론가들에겐 편리하고 획기적일지 모르겠다만 가끔은 좀 바보같아 보인다. 얼터너티브가 꽤나 급속도로 메탈씬을 잠재웠음에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대안'이 아닌 그저 흘러가는 유행이었듯, '포스트록' 또한 록 이후의 어떤 새로운 움직임이 아닌 아트록 만큼이나 지루한 하나의 클리셰 과정을 답습해나가고 있다. 레이첼스(Rachel's)나 토어터즈(Tortoise), 혹은 트랜스 앰(Trans Am) 같은 팀들이 소위 '포스트록'으로 분류됐었을 당시에는 그 영역의 광범위함은 물론 꽤나 그럴듯한 용어였고 실제로 록 '이후'의 어떤 징후처럼 다가오곤 했다.
아무튼 이 용어는 점차 정형화 되어가면서 이상하게도, 뭐 모과이(Mogwai)나 갓스피드 유 블랙 엠퍼러(Godspeed You! Black Emperor)와 같은 연주 중심의 록(인스트루멘틀 록이라고도 통칭되어진다.)을 하는 후예들을 일컫는 말로 고정됐다. 이 노래들은 모조리 정과 동, 멜로디와 굉음 사이를 오가는 기타의 중첩, 그리고 노스 페이스 히말라야 모델을 입고 눈보라 치는 험준한 산악지대를 등정하는 것 같은 고난의 절정으로 점차 진입해 들어가면서 클라이막스를 맞는다. 그러니까 이런 전개는 한국에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는 R&B 가요 풍의 곡 막바지에 워우워어~하면서 온갖 기교와 감정과잉의 방식으로 절정으로 돌진해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 때문에 여기서 또 한번 궁금해지는 것은 과연 이런 음악들이 어떤 연유로 '포스트'라는 말을 하사받게 됐냐는 대목이다. 보컬이 없다는 점? 정말 그런 이유에서라면 '이후(Post)'라는 표현이 민망할 정도로 옛날에도 넘쳐났다. 벤쳐스(Ventures), 딕 데일(Dick Dale) 등등.
공간계 이펙터와 강렬한 디스토션을 이용해 소리의 층을 쌓아가는 과정, 혹은 톤도 밴드마다 그리 큰 편차는 없는 편이었다. 유명한 포스트록 밴드들의 잘 모르는 곡들 몇 개를 섞어놓고 한번 실험해 보시라. 오히려 이런 음악을 듣다가 필 스펙터(Phil Spector) 류의 '월 오브 사운드'를 들으면 더 놀랍곤 했다. 지금 우리는 뭔가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세대가 변해가는 것을 보고있는 것일 수도. 다음 타자는 또 뭐가 될까? 뭐 일본에서 줄곧 쏟아져 나오는 좀 더 복잡한 전개로 구성시켜낸 포스트록의 실용음악 전공자 버전 같은 것들?
아무래도 안티테제로서 존재하던 장르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포스트록이라 분류되는 밴드들은 포스트록을 듣지 않는다거나, 포스트록이 뭔지에 관심이 없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KBS 탑밴드 같은 프로그램에 응모를 하는데, 프로필에 자신들이 하는 음악을 두고 손수 '포스트록'이라고 써놓으면 모양새가 엄청 촌스러워지는 것 같은 이치였다. 뭐 생각해보니 과거엔 하이브리드나 핌프 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진 장르들도 있긴 했던것 같다. 펄 잼(Pearl Jam)의 스톤 고사드(Stone Gossard)는 '그런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그런 얘기'는 도대체 누가 만들어내는 건가?
pg.lost
마찬가지로 인터뷰에서 자신들이 포스트록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 밋밋하게 반응했던 피지 로스트(pg.lost)는 스웨덴의 항구도시, 그리고 화학공업의 중심지인 노르셰핑에서 2004년도에 결성됐다. 스톡홀름이나 예테보리같이 잘 알려지거나 큰 도시는 아닌데, 때문에 정작 스웨덴 씬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한다. 비포 유 기브 인(Before You Give In)이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시작했지만 멤버가 교체되면서 현재의 이름으로 고정됐다. 인터뷰에 의하면 원래 처음부터 피지 로스트로 하려 했었다는데, 비포 유 기브 인이 덜 추상적이고 기억하기도 쉽기 때문에 첫 공연 때 이 이름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정한 뜻으로 확정 지어진 이름은 아니었고, 보통 'pg'는 'page'로 스스로 소개하기도 한다. 2005년 무렵 셀프타이틀 데모 EP를 발매한 이후 [Yes I Am]이라는 EP를 공개했고, 데뷔작 [It's Not Me, It's You!]를 2008년도에, 그리고 2009년도에는 [In Never Out]을 발표하면서 씬의 어떤 정점에 올랐다.
두 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높은 평가를 받았던, 뮤(Mew)나 뮤즈(Muse)를 연상시키는 로맨틱한 3인조 록 밴드 에스큐 디바인(Eskju Divine) 출신의 두 멤버 마티아스 바트(Mattias Bhatt: Guitar)와 크리스티앙 칼슨(Kristian Karlsson: Bass/ Vocal)을 중심으로 밴드가 결성됐다. 마티아스 바트의 경우 에스큐 디바인에서는 기타가 아닌 드러머로써 활동했었는데, 그들이 이전에 속했던 밴드 에스큐 디바인에는 기타 대신 피아노 멤버가 존재했고, 그럼에도 충분히 록킹하고 충동적 표현들로 무장해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인 구스타프 앨름버그(Gustav Almberg: Guitar)와 마틴 헤르트스테드(Martin Hjertstedt: Drum) 또한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한다.
이들은 매 인터뷰마다 재미로 밴드를 결성했다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이전에 했던 밴드에서의 실험적 야심을 채우기 위해 시작한 것 같다는 인상을 줬다. 앞서 얘기했듯 포스트록이나 영향에 관해서는 가급적 직접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었다. 우울한 두 대의 기타의 섬세한 트레몰로, 그리고 아름다운 굉음 같은 특징은 동종업계의 익스플로전스 인 더 스카이(Explosions In The Sky)나 일본의 모노(Mono), 캐스피안(Caspian), 혹은 같은 북유럽 출신인 엡파토리아 리포트(The Evpatoria Report)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 같다. 인디 할다(yndi halda), 해먹(Hammock), 디스 윌 디스트로이 유(This Will Destroy You) 등의 대표적인 후발주자들 사이에 피지 로스트의 이름 역시 항상 함께 거론되곤 했다. 아무튼 밴드는 2010년 무렵 drop-d.ie라는 웹진과의 인터뷰 당시 현재 자신들이 듣는 음악의 목록을 나열했던 바 있었다. 참고 바란다.
Martin Hjertstedt
Mutiny Within - Mutiny Within
Opeth - Watershed
Copeland - You are My Sunshine
Mattias Bhatt
Beach House - Teen Dream
Broken Social Scene - Forgiveness Rock Record
Kidcrash - Snacks
Gustav Almberg
Jay Reatard - Watch Me Fall
Villagers - Becoming a Jackal
Adebisi Shank - This is the Second Album of a Band Called Adebisi Shank
Kristian Karlsson
Black Keys - Brothers
Radiohead - Ok Computer
Queens of the Stone Age - Rated R
밴드에겐 꽤나 드문 사례가 하나 있었다. 바로 어떤 사람이 이들의 데모 음원을 자신의 곡이라고 속여 레코드 회사로 보내면서 발매까지 진행됐던 일화였다. 본격적인 레코딩을 하기 이전부터 들을만한 곡들을 써왔던 지라 이런 일이 벌어졌던 모양인데, 정작 밴드는 이에 대해 크게 생각하고있지 않고있다고 밝혔다. 아무튼 2007년도에 데뷔 EP [Yes I Am] 이후 또 다른 4 피스 포스트록 밴드의 등장을 알리면서 이쪽 팬들을 본격적으로 끌어 모으기 시작한다.
In Never Out(2009)
2009년도의 끝자락에 발표된 이들의 두번째 정규작 [In Never Out]은 1집에 이어 스웨덴의 인디 레이블 블랙 스타 파운데이션(Black Star Foundation)으로부터 릴리즈 됐다. 두 번째 작품에서는 더 어둡고 절망적인 분노를 표출해내려 했지만 정작 레코딩을 하고 노래를 만들면서는 다른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됐다고 한다. 아무튼 전작보다는 파괴적인 기운이 두드러지는 편이었다.
한 노트를 마디 첫 소절마다 연주하는 피아노 사이에 희뿌연 리버브+딜레이로 엮여진 기타 트레몰로 이후 폭발시켜내는 첫 곡 [Prahanien]으로 앨범이 시작된다. 드라이브감 있는 베이스, 그리고 엇박으로 들어가는 비장한 멜로디의 [Jura], 기타 아르페지오로만 이루어진 전반부와 업템포의 댄서블한 비트로 구성된 중반부를 지닌 [Heart of Hearts], 그리고 느리게 붕괴되어가는 [Still Alright]의 곡들은 어떤 이야기를 그려나간다. 비교적 사운드의 앞쪽에 배치되어있는 선명한 드럼 톤이 인상적인 [Crystalline], 굉음의 노이즈와 무거운 리듬을 통해 듣는 이들을 어떤 종반부로 인도해내는 [Gomez]로 앨범이 매듭지어진다. 곡이 끝난 이후 라디오 주파수에 잡힌 듯한 몇몇 오래된 노래들이 여운처럼 남겨진다.
적막감이 감도는 소리의 빈 자리에 서서히 희미한 기타가 스며들어가고, 섬세하고 선명한 트레몰로, 그리고 노이즈/디스토션에 파워풀한 리듬 섹션들이 가미되면서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은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슬프고 아름다운 사운드는 꽤나 감정적으로 황혼의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있었다. 여전히 이런 류의 음악들은 듣고 나면 진이 빠지는데, 이를 선명한 생채기 정도로 적어놓아도 무방하겠다.
억지로 짜맞춘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스웨덴, 혹은 북유럽 부근의 느낌을 주고 있는 듯하다. 특히 이쪽동네 음악들의 특징인 마이너 조에서 메이저조로, 혹은 그 반대의 전조를 보여주는 전개들 또한 다수 눈에 띈다. 내성적인 느낌의 쿨한 소리는 신축성과 감미로운 도취감을 가진 채 이성을 잃어갔다. 비교적 흔하게 존재하는, 좋게 말하면 친숙한 프레이즈의 곡이 많고 드라마틱한 멜로디들 또한 제대로 연주되어지는 편이다.
소위 이런 장엄한 멜로디와 호들갑스러운 전개가 이어지는 포스트록 앨범 해설지들을 그 동안 다수 써왔던지라 새로운 미사여구를 찾는 것이 쉽지않다. 맨 처음에는 이게 내 어휘의 한계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가사는 없는데다가 음악 자체의 구성, 그리고 사용하는 이펙터나 악기들이 모두 비슷비슷하고 코드와 곡의 전개들 마저 비슷비슷한지라 아마 다른 이들이 해설지를 작성해도 뭔가 아주 다른 표현이 나올 것 같지 만도 않다. 아무튼 뭐 이런 음악은 이런 맛에 듣는 것이고, 수요가 있다면 음반들은 계속 발매될 것이다. 참고로 어느 중국 웹진과의 인터뷰에서 피지 로스트는 스웨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음악을 해서 벌어먹고 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 북유럽 슈게이저들은 2010년 9월 경 중국의 여러 도시와 홍콩, 대만을 돌기도 했는데, 이번 아시아 투어에서는 한국 또한 방문할 모양이다. 이런 소리는 확실히 공연장 용이기 때문에 노이즈를 견뎌낼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쯤 방문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올해 초에는 [Vultures]라는 신곡을 스트리밍하기도 했으며, 다음 작품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특정 방향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언급했다.
아무튼 누군가가 했던 얘기처럼 포스트록(정확히는 인스트루멘탈 록)은 마치 블랙메탈이라는 장르가 걸어왔던 길을 답습해나가고 있다. 이 음악들의 코어팬들은 줄곧 한국 혹은 북유럽에 포진되어 있는데, 해외에서 극소수에게 알려진 블랙메탈 밴드를 국내 포탈 사이트 네이버 같은데서 검색해보면 신기하게도 다 나오는 것처럼, 포스트록 역시 그런 류의 코어한 팬덤을 이 땅에서 만들어나가고 있는 듯 보인다.
이렇듯 마치 트롯트나 힙합처럼 포스트록 역시 하나의 장르로써 굳어져가고 있다. 뭐 사실 연주음악이 장르화 되어가는 것이 그렇게 신선한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도 연주만으로 이루어진 경음악 모음집들은 얼마든지 있어왔다. 이런 일련의 포스트록 작업물들을 우리세대의 '로큰롤 경음악집' 정도로 받아드려도 무방하겠다.
정확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고, 말이 설득력이 없어질 때 그 자리에는 보통 침묵보다는 어떤 소리로 대체되곤 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점점 무거워져만 갔다. 뭐 일종의 현실반영 같은 건가. - 한상철(파스텔 문예부)
 |
 |
 |
 |
|---|
2. Jura
3. Heart Of Hearts
4. Still Alright
5. Crystalline
6. Gomez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