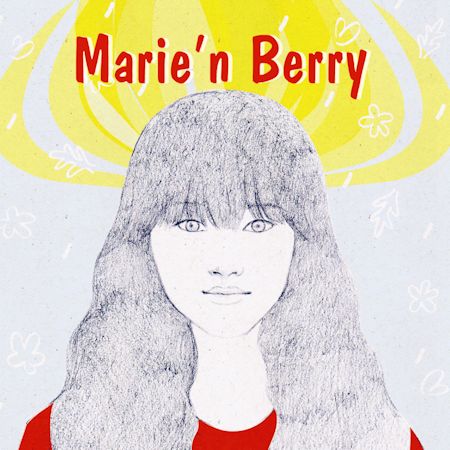|
 |
 |
 |
|---|
회사원 안대리라는 이름, 슈트를 입고 출근하는 아저씨 자킷과 가로 막대형 그래프로 트랙 러닝타임을 표기한 외형적인 앨범 모양새는 의도적인 키치를 인디 본연의 쿨함으로 (미디어에 의해) 왜곡되어 버린 요즘 잘 나가는 쑥고개과 붕가붕가의 또 하나의 작품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붕가붕가 출신들이 선점하다 못해 너무나 식상한 아이템으로 만들어 버린 시장에 늦게 편입한 음반이라는 선입견에서 바라본다면 ‘나도 니가 좋아’에서는 술만 먹이는 부장님을 디스하고, ‘Sunflower’는 아닌 자신의 ‘해바라기’를 자랑하는 과장님의 것을 따라하고 싶어하고, ’점심시간’에서는 좋아하는 여사원과의 에피소드를 노래할 것만 같다.
다시 말하자면, 배 나오고 술에 찌든 20대 후반 남자 직딩이 기타치고 노래하는 전설의 볼빨간의 아류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를 잘 모른다면 조까를로스와의 데자뷰다.
더군다나 그의 의도와 목적이 나름 자신을 성시경과 빅뱅을 듣는 다른 또래들의 수준을 논하기 위해 자신을 브로컬리 너마저나 넬을 들으며 차별화 하는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언니들에 있었다면 그들의 눈길 조차도, Wishlist를 터치 또는 클릭 할 떡밥 꺼리가 되지 못해 보이기도 한다.
게다가 전통의 인디 레이블 ‘카바레’에 한때 몸 담았던 플라스틱 피플의 객원 기타리스트 였다라는 부가정보는 위의 개연성을 더욱 강화시킬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음악은 잘 나가던 ‘카바레’ 시절에 은희의 노을, 메리 고라운드틱한 아마추어리즘으로 순수하게 단장한 보컬 없는 기타팝이다.
그렇다고 최근 홍대 인디밴드들이 후반부 트랙에서 쉽게 저질러 버리는 천진난만한 사운드를 깐 악의없는 예쁜 키취 송의 나열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기자기한 리프와 디스토션을 완전히 배제한 일렉트릭 기타로 영리하게 만든 몽환의 연속이다.
2000년대 말 The XX 등장 이전 적당히 패배적인 자세로 긍정적인 꿈을 꾸는 수 많은 런던 클럽의 Bad Drawn Boy 워너비들의 감성으로 표현한 사운드 말이다.
파도 소리가 났다면 분명 Fast Forward 시켜버려 놓쳤을 뻔한 ‘Into the surf’에서 느껴지는 회화적인 낭만성을 Pat Metheny식의 구조로, ‘나도 니가 좋아’에서 느껴지는 서정성과 흥겨움을 Red House Painters가 표현하던 영롱한 톤으로 나타낸다.
보컬이 없어 느낄 수도 있는 지루함은 ‘The moon in La Jolla’와 ‘돌아오는 길’의 듣기 편안한 선율감으로 만회시킨다.
이 음반은 잘 나가는 인디 팝 아티스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근래 드문 솔직함이 있다.
겉멋과 자의식에 대한 무모한 강박이 없다는 점이 잘 나가던 시절의 ‘인디’를 지탱하던 태도 중 하나였다는 사실에서 이 음반의 의미를 짚을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장난스럽고 간지 중심의 홍대 인디 음악에 대한 안티테제로서 그는 또 다르게 폼 나는 로파이라던지 요즘 대세가 될 수도 있는 애시드 포크가 아니라 홍대 인디씬 구석에서 새로운 영역을 예전 동아기획 사단들의 감성과 연결하여 만들어낸다.
이 작품에 대해 홍대의 이병우의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의 프리퀄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달아도 될까? 후속 앨범이 보컬이 얹어진다면 어떤 날의 프리퀄이라고 상상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
 |
 |
 |
|---|
2. 나도 니가 좋아
3. The Moon In La Jolla
4. Wish Me A Merry Christmas
5. Sunflower
6. 돌아오는 길
7. 점심시간
8. My Princess Is Gone In New Year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