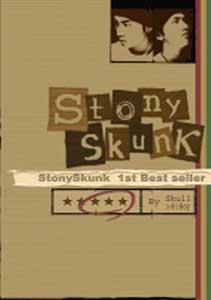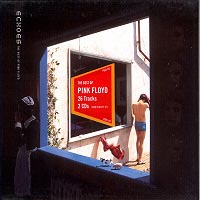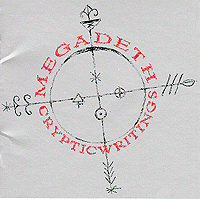|
 |
 |
 |
|---|
본 작은 기묘하고도 위태롭고 애처로운 각종 병기(病期)에 관한 이야기다. 소통의 단절, 불안, 고립, 권태 등 스스로 좀 먹는 감정과의 싸움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건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다.
내부와 외부의 극명한 온도 차,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는 천당과 지옥과도 같은 감정의 기복, 희망과 절망 사이에 한발씩 담그고 수없이 마음먹는 고통보다도 창작자에게 가장 큰 공포의 대상은 ‘하고 싶은 말이 없어지는 상태’ 그 자체일 것이다.
데뷔 7년째에 접어든 밴드 쏜애플이 남극에서 적도로, 밤에서 낮으로 무던히 발걸음을 옮겨온 과정을 돌아보면 음악이 이들의 숙명이었는지, 아니면 밴드 스스로 음악을 숙명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법하다. ‘음악’을 방패로 현실을 외면하고 판타지에 갇혔는지, 반대로 ‘음악’이 밴드의 현실과의 통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던질 법도 하다. 출구 없는 교착 상태가 지속될 때 창작자는, 음악가는, 아니 모든 사람은 본질을 고민한다. 음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끝 모를 불안감과 싸우는 것은 물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누구의 등에나 업혀있을 자기혐오와 자기현시 사이에서 끝없이 갈등한다. 언제나 ‘어떤 삶에서든 최적의 밸런스는 없다’로 결론이 나긴 하지만.
그렇게 밴드는 이 앨범 안에서 정처 없이 성찰의 길을 떠난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치열하게 한낮을 걷고,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떠올리며 현재를 인식한다. 비틀어지고 어긋난 세상을 탓하는 대신 그 세상에 자신을 비춰보며 뜨거움을 열망하지만 뜨겁지 못한 자기모순을 발견한다. 불교 설화의 귀자모신(鬼子母神) 이야기에서 끌어온, 본질을 섭식하지 못하며 점점 커지는 ‘허무’의 상태를 표현하고, 끝을 믿고 바라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한 끝없는 윤회로 결국 모든 것에는 끝이 없을 거라는 공포에 몸을 떤다. 그럼에도 받들고 있는 끝에 대한 믿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잠시 뉘었다가 애처롭고 멀건 눈으로 ‘서울’을 바라본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이 생을 끝내기 위해 다리 위에 오르고, 친구가 아닌 사이에 ‘친구’를 남발하는, 피가 밴 생채기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발길에 챌 만큼 많지만 정작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없는, 각종 병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갇혀 버린 생지옥 ‘서울’.
지난 1년간 세션 연주자로 밴드의 기타 연주를 도왔던 홍동균이 <서울병> 발매를 앞두고 쏜애플 정식 멤버로 합류하게 되면서 사운드의 밀도감과 입체감 또한 커졌다. 시각화된 음악에 특히나 감각이 탁월했던 밴드는 각 트랙의 무드와 질감 표현에 에너지를 쏟았다. 그리고 각각의 악기가 존재감을 갖되 유기적이고 촘촘하게 얽힌 사운드에 공을 들였다. 문학적인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퍼포먼스에 탁월했던 보컬은 이번 앨범에서 또 다른 보컬인 기타와 끈적이게 들러붙는다. 5곡의 총 러닝 타임이 30여 분에 이를 정도로 각 트랙의 무드가 드라마틱하게 진행되는 데에도 역시 공을 들였다. 농도와 밀도의 압축도로 보면 정규 앨범 못지않다.
한 편의 옴니버스 단편 영화를 보는 듯 <서울병>의 다섯 곡은 퍼즐을 구성하는 각각의 조각들로 독립적으로 기능한다. 전작들과는 달리 각 트랙이 가진 성질이나 감각, 직관에 의존해 작업했고 이성보다 감성의 영역 안에 오래 머물렀던 흔적 또한 역력하다.
<서울병>은 음악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하고 파괴하고 해체한 끝에 도달한 하나의 결론이다. 앞으로도 쏜애플은 불가능의 영역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로맨티시즘의 길을 확고히 걸어갈 거라는 청사진이기도 하다. ‘결핍이 대상을 파괴하면서 제 결핍을 재확인하는 길은 욕망의 길이고, 결핍이 다른 결핍을 어루만지면서 제 결핍마저 넘어서는 길은 사랑의 길’이라는 신형철의 말처럼 결핍은 또 다른 결핍을, 고통은 또 다른 고통을 위로한다.
/ 조하나(음악 칼럼니스트)
 |
 |
 |
 |
|---|
01. 한낮
02. 석류의 맛
03. 어려운 달
04. 장마전선
05. 서울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