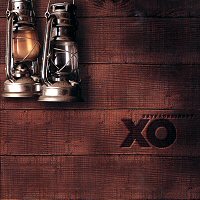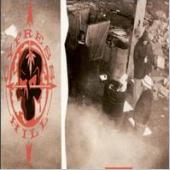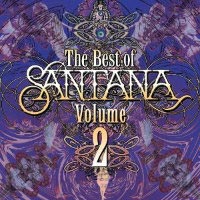|
|
 |
 |
 |
 |
|---|
“7년의 긴 공백을 깨고 마침내 돌아온 한국 국가대표 헤비메틀 그룹 크래쉬”
“더 이상의 기다림은 없다…!!”
1994년이 그 시작이었다.
근대화에 대한 집착과 수치적인 외형 불리기에만 급급하던 대한민국은 그 성장통을 겪고 있었다. 성수대교 붕괴, 장교무장탈영, 지존파 살인 등 연일 터져나오는 사건 사고 속에서 크래쉬의 데뷔작 [Endless Supply of Pain]이 세상에 선보이게 된다. 메탈포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머쉰헤드(Machine Head), 세풀투라(Sepultura) 등을 작업했던 Colin Richardson 이라는 거물 프로듀서를 대동하고 완성한 이 앨범은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사회의 현주소가 치환된 듯 대중음악계의 달콤함 뒤의 고통을 먹고 자란 언더그라운드 락계의 필연적 산물이었다. 크래쉬의 등장은 프론트맨을 배출하고 이내 솔로로 전향하며 곧 사장되는 수많은 락 밴드들 사이에서 밴드로서의 포맷이 얼마나 단단하고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지 스스로 증명해냈다. 그건 스래쉬메틀이라는 과격한 장르로 외국 유명 프로듀서를 기용하여 높은 판매고를 이루어냈다는 표면적인 성과에 비할게 아니다. ‘자아‘라는 주제의식을 중심에 놓고 토해내는 헤비한 리프와 짐승같은 거친 보컬, 육중한 더블베이스 드러밍은 외국 유명 밴드에 대한 단순한 동경이나 모방이 아닌 흡수와 재창조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같은 해, 무엇을 하든 이슈화되고 공론화되던 서태지와 아이들의 3집의 수록곡인 “교실이데아”에 게스트로 참여하여 화제가 되었다. 이는 대중가요계에 크래쉬의 존재를 알리게 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고, 뒤이어 1995년작 [To Be or Not To Be]를 발표한다. 보다 그루브하고 매끈한 훅이 살아있는 이 앨범은 데뷔작에 비해 한층 정돈된 사운드로 호평받았다. 그러나 이 앨범을 끝으로 음악적 견해차이를 이유로 기타리스트 윤두병이 탈퇴하여 기타리스트 하재용과 이성수를 맞이한 4인조의 라인업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새 멤버와 함께 영국에까지 날아가서 다시 한 번 Colin Richardson 과 작업한 1997년작 [Experimental State Of Fear]은 팬들과 미디어 등에서 크래쉬 사운드의 완성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앞서 말한 기타리스트 윤두병의 탈퇴는 보다 새로운 요소들을 조합하고 받아들이려는 크래쉬의 다양한 시도에 대한 반감이었다. 그리고 그 시도의 최종 결과물이 바로 2000년작 [Terminal Dream Flow]이다. 넥스트(N.EX.T)의 키보디스트 김유성을 맞이하여 인더스트리얼과의 본격적인 조우를 지향했던 이 앨범은 결과적으로 크래쉬 멤버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헤비함이 다소 거세된 작품이었다. 그러나 그 실험적인 시도들이 곡 자체의 완성도 미비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Failure", "2019 A.D", ”Apocalypse" 등에서 보여준 하이브리드함은 진보라고 부를 수 없는 변화라고 할지라도 나름의 훅을 갖고 있었고 다이나믹함 또한 갖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헤비함과 하이브리드함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사운드 적인 측면에서의 실수일 뿐이지 앨범 자체의 실패는 아닌 것이다.
이듬해, 2001년 컴필레이션 [Indie Power 2001]에 신해철의 프로젝트 모노크롬(Monocrom)의 “니가 진짜로 원하는게 뭐야”를 커버하여 수록하였고, 유명 TV CF 에 사용되며 공중파 TV 음악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이건 엄밀한 의미의 타이업(Tie-up)은 아니었고 CF를 위한 사용에 불과했다. 이는 공동 프로모션과는 의미가 아예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이는 거대 미디어의 소비라는 측면에 이용된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2000년작 [Terminal Dream Flow]의 앨범과 그에 이은 활동까지 싸잡아서 상업적으로 변질되었다는 오명을 받게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안흥찬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불편함을 드러낸 바 있다.)
이를 만회라도 하듯, 2003년 [The Massive Crush]를 발표한다. 키보디스트 김유성이 탈퇴하고 기타리스트 임상묵을 맞이하여 다시금 트윈기타체제로 선보인 이 앨범은 사실 커버곡과 예전 곡의 재녹음 버전 등을 제외하면 신곡이 7곡 뿐인 과도기적인 앨범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Sterling Sound 의 Ted Jensen 이 마스터링하는 등 여러모로 공을 들인 작품으로 정통적인 뮤트 플레이 위주의 절도있는 기타리프를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스래쉬메틀에의 접근이 돋보였다. 그럼에도 앨범 곳곳에서 느껴졌던 불안한 기운은 크래쉬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무려 7년이라는 동면으로 인도했다.
이제 새 앨범 [The Paragon of Animals]로 돌아온 크래쉬가 여기있다. 무엇보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원년 멤버인 기타리스트 윤두병의 복귀이다. 나티(Naty)의 2006년작 [Long Time No See]와 2009년 신가람의 앨범으로 간간이 모습을 드러냈던 윤두병의 기타는 크래쉬의 초기 시절보다 더욱 완숙하고 서슬퍼런 연주로 돌아왔다.
또한, 국내 락 앨범을 수없이 매만지며 내공을 쌓은 엔지니어 조상현과 함께 크래쉬 스스로의 스튜디오에서 레코딩과 믹싱을 해냈다. 우선적으로 기타엠프헤드와 캐비닛, 기타의 가장 이상적인 조화를 수없이 실험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완성한 사운드의 질감은 무척이나 오밀조밀하다. 날카롭지만 가볍지 않고 묵직하지만 둔탁하지 않다. 마이킹에 대한 세심한 주의는 탄탄한 저음역과 폭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로 공간감을 살린다. 전작에서의 만족할만한 결과물 덕분이었는지 이번에도 Sterling Sound 의 Ted Jensen 이 작업한 마스터링은 가시적인 큰 차이를 만들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려했던 2000년작 [Terminal Dream Flow]의 인더스트리얼/테크노의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신작의 주안점은 크래쉬만의 정통적인 스래쉬메틀 노선을 유지하되 트렌디한 모던 헤비니스의 면모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기타리스트 하재용과 윤두병의 연주는 때로는 격렬하게 부딪치고 때로는 유니즌을 이루며 직선적으로 전개해나간다. 뼈대를 이루는 정용욱의 드러밍은 타격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며 한 곡 내에서도 수없이 컴비네이션을 만들어내고 스트레이트하게 파고든다. NWOAHM 의 분위기가 전면에 드리워져 있다고해서 굳이 트리비움(Trivium)이나 램오브갓(Lamb Of God) 등 을 들먹이지는 않는 것이 좋겠다. 원산지 표기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이라면, 현재 미국과 유럽 헤비니스씬의 대세는 이름 그대로 New Wave Of American Heavy Metal 아니던가.
이미 전작인 2003년 [The Massive Crush]의 사운드적 방향을 킬스위치인게이지(Killswitch Engage)와 머쉰헤드(Machine Head)에 맞추었던 크래쉬였다. 그래서 이번 앨범에서 느껴지는 감각적인 모던 헤비니스에 대한 접근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그 표독스런 의도는 앨범 전체에 흐르는 일관성과 함께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7년여간의 공백을 한 풀이라도 하듯 앨범 타이틀곡인 ‘Crashday’를 필두로 쉴새없이 몰아치는‘Ruination Effect’와 ‘Misguided Criminals’, ‘Revolver’와 ‘Creeping I Am’등과 같이 그루브가 충만한 곡들이 대거 포진돼 있으며 오케스트레이션과 윤두병의 아웃트로 솔로가 백미인 ‘Cold Blooded’으로 본 앨범의 완성도를 한껏 드높였다. 위에 언급한 설득력이란 대한민국 헤비메틀 밴드이기 때문에 라는 핸디캡을 인정하거나, 크래쉬라는 이름이 갖는 어드밴티지를 주어서가 아니다. 현대적인 헤비함에 대한 고민과 집요한 실험 끝에 나온 그 커다란 울림이 모든 트랙을 다 돌고난 뒤에도 여전히 귓가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록곡 중 “Crashday"가 앨범 발매 전 비디오클립으로 먼저 선보였다. 살을 에일 듯한 윤두병의 날카로운 기타솔로에 바로 이어지는 하재용과의 합(合)은 탄성이 터져나올 정도로 다이나믹하다. 7년의 시간을 감내한 크래쉬의 분노이다.
7년이다. 인디라는 이름아래 무책임하게 상업적으로 노출되었던 락씬은 음악 자체를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었고 뮤지션은 누가 더 소비자를 즐겁게 하여 팬카페 회원수를 늘릴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 듯 희화화되었다. 고뇌의 산물이던 앨범은 기호에 맞게 팬시상품으로 전락하고 대중가요와 별반 다르지 않은 30초짜리 벨소리 만들기에만 급급하다. 특히 그나마 남아있는 헤비메틀 밴드들은 이쁘장한 소년 소녀들에게 크고 작은 무대를 내주고 몇 안되는 클럽에서 요일과 시간을 쪼개며 연명하고 있다.
락, 헤비메틀 그것도 스래쉬메틀이라는 마이너 장르에 이제껏 버텨온 크래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다. 다만, 그 변화의 시작이 아니 정화의 첫 수순이 크래쉬의 [The Paragon of Animals] 였으면 한다. 첨병이 될 자격이 충분할 정도로 이 앨범에 담긴 크래쉬의 포효는 진중하고 절실하다. 독하다. 쓰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날은 바로 오늘이다. Crashday!
- 글 / lunaplug@hanmail.net
 |
 |
 |
 |
|---|
2. Ruination Effect
3. Misguided Criminals
4. Revolver
5. Cold Blooded
6. Redlambs
7. Creeping I Am
8. Atheist
9. Lucid Sycophant
10. The New Black
11. Fierce People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