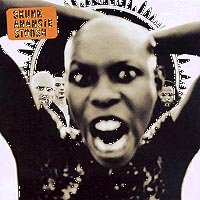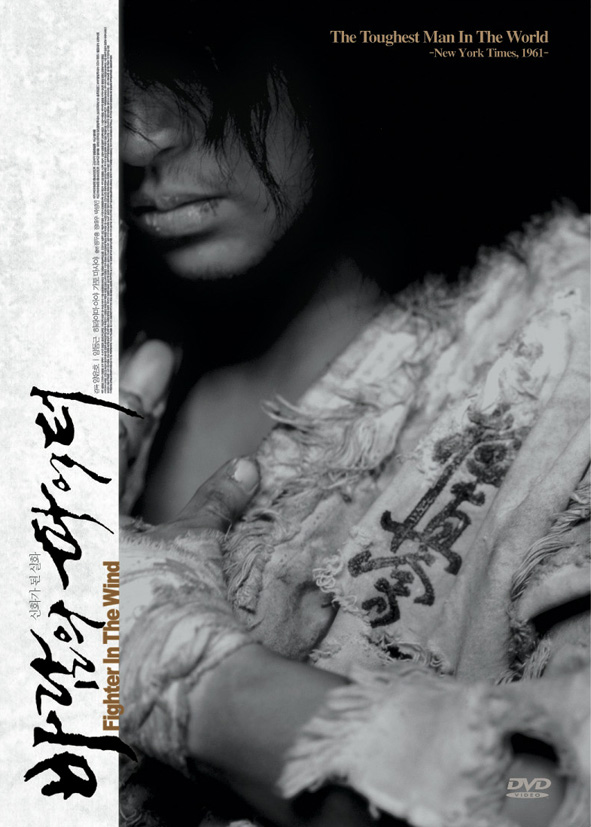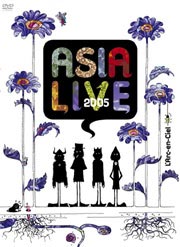|
 |
 |
 |
|---|
힙합과 재즈의 결합을 통해 재즈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Robert Glasper [Black Radio]
뮤지크 소울차일드, 에리카 바두, 크리셋 미첼, 라라 해서웨이, 모즈 데프, 비랄 등 당대 Hip Hop, R&B의 수퍼스타들과 함께 선보이는 걸출하고도 화려한 블랙 사운드. 원곡과는 전혀 다른 해석과 접근을 시도한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샤데이의 'Cherish The Day'의 리메이크 등 기존의 힙합 재즈에서 한층 더 세련되고 독창적인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는 로버트 글래스퍼의 감각적인 아이디어가 빛을 발한다. 에리카 바두가 함께 참여한 'Afro Blue'는 반드시 들어보아야 할 필청 트랙!
두 아프로- 아프리칸 뮤직의 진정한 조우! 힙합과 재즈의 상투적인 결합을 넘어선, 새로운 차원의 결과물
재즈와 힙합이 함께 어우러진 결과물은 2012년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 새롭다거나 혹은 도전적인 조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미 우리 앞에는 적어도 이런 작업과 관련된 많은 작품들이 놓여 있다. 80년대 중반 영국에서 시작된 애시드 재즈를 제쳐두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마일스 데이비스의 사후 발표되었던 정규 스튜디오 유작인
브랜포드 마살리스가 DJ Apollo와 함께 결성했던 프로젝트 그룹 벅샷 르퐁크(Buckshot Lefonque)의 음악도, 그리고 피아니스트인 허비 핸콕이 1995년도에 발표했던
이런 작업은 앞서 언급했듯 재즈 뮤지션 이외에 힙합 쪽 아티스트들에게서도 종종 시도되어져 왔다. 물론 거의가 메이저 팝 신에서 보이던 그런 힙합 가수들과는 음악적인 접근 자체가 다른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인데, 드러머 ?estlove를 중심으로 80년대 중반 결성된 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온 명 그룹 루츠(The Roots)는 랩 이상으로 연주 중심의 힙합 음악을 구사하면서 거기에 사운드적인 측면과 화성적인 진행 면에서 재즈적인 요소를 차용해 음악적 범위를 다양화시키는 작업을 꾸준하게 해왔다.
Ali Shaheed Muhammad, Q-Tip, Phife Dawg이 1988년도에 뉴욕에서 결성한 또 하나의 전설적인 동부 힙합 트리오 ‘A Tribe Called Quest’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은 멤버들이 그룹 활동을 중단한 채 각자 솔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들이 함께 만들었던 음악은 힙합의 음악적 가치가 지금처럼 단지 댄스용이나 선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되려 넌센스처럼 느껴질 만큼 가볍지 않은 면을 보여주었으며 거기에 흑인음악 전반의 요소까지 고루 반영되는 모습을 드러냈었다.
로버트 글래스퍼는 바로 이 같은 선배들의 유산을 직접 이어받아 자신의 음악을 형성시켜온 뮤지션이다. 물론 그는 재즈 뮤지션으로서 흔들림 없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차세대 재즈 신을 이끌어갈 젊은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며 그 잠재력에 커다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R&B와 힙합(Hip-Hop)에 대해서 재즈 못지않은 아주 커다란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더불어 충분히 그 장르의 본질을 이해하고 소화해낼 줄 아는 역량도 지닌 뮤지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힙합 뮤지션으로 분류하더라도 사실 그리 틀린 표현은 아니라고 본다. 1978년생인 그는 10대 시절 본격적으로 음악을 듣고 배우는 과정을 거칠 때 힙합이 동시대에 생겨나고 형성되어 대중들에게 어필하는 과정을 직접 눈과 귀로 목격하면서 성장했다.
재즈와 블루스, 그리고 이와 가스펠의 혼합으로 생겨난 리듬 앤 블루스와 마찬가지로 아프리칸 아메리칸(African-American)에 의해 창조된 이 음악은 분명 이전까지 존재했던 여러 흑인 음악의 요소들을 자양분으로 삼아 생겨난 것이지만, 비트와 사운드의 질감이 확실히 과거의 전통적인 R&B와는 다른 면이 있었다. 특히 이 장르의 가장 도드라진 특징인, 음정의 고저와 흐름이 없이(혹은 아주 미약한 상태에서) 비트를 타고 말하듯 가사를 읽고, 즉흥적으로 내뱉기도 하는 랩(Rap)이라는 표현방식, 그리고 DJ에 의해 주도되는 샘플링과 프로그래밍 작업은 기존의 악기 연주를 통한 방식과는 또 다른 사운드를 만들어 내었으며, 로버트 글래스퍼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진 힙합이 점차 대중음악의 주류로 부상해가는 과정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힙합은 재즈와 마찬가지로 주요한 음악적 언어로서 거의 동등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즈만큼이나 자신의 음악에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중요한 틀이자 소통하는 매개체로서 작용한다.
작년 말 뉴욕의 블루 노트 클럽에서 로버트 글래스퍼는 카니에 웨스트, 모즈 데프 - 현재는 야슬린 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상태다 - 같은 힙합계의 대표 아티스트들과 자신의 그룹 멤버들이 함께 즉흥 잼 세션 무대를 꾸미며 현지 언론과 팬들에게 상당한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 사실 그의 팬이라면 전작인
이 앨범에서 로버트 글래스퍼는 21세기 현 재즈 신에서 적어도 가장 트렌디한 사운드이자, 아직은 뭐라고 정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그 무엇을 표현해보려고 시도했으며, 그 결과는 성공적인 것이라고 보기엔 평가가 다소 이를지 몰라도 독창적인 사운드를 만들어 내는 데에는 분명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었다.
그건 분명 이전까지 빈번하게 시도되어오던 R&B와 소울, 펑크적인 접근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특히 허비 핸콕의 명작 ‘Butterfly’ 같은 곡의 재해석은 힙합이라는 장르만의 독특한 질감을 담아내고 있어 분명 새로운 스타일의 버전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엔 현재 R&B, 힙합 등 흑인 음악 신에서 잘 나간다는 뮤지션들의 이름이 가득 담겨져 있다. 전작에서 이미 함께 한 경험이 있던 보컬리스트 비랄(Bilal)은 물론이고 모즈 데프(Mos Def), 루프 피아스코(Lupe Fiasco)같은 동부 힙합신의 대표적인 래퍼들, R&B 싱어인 크리셋 미첼(Chrisette Michele)과 그룹 민트 컨디션의 리드 싱어인 스토클리 윌리암스(Stokley Williams), 뛰어난 베이스주자이며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 아티스트이기도 한 미셀 은디게오첼로(Meshell Ndegeocello), 지금은 세상을 떠난 거물 싱어 도니 해서웨이의 딸이자 그녀 자신이 훌륭한 R&B 보컬리스트이기도 한 라라 해서웨이(Lalah Hathaway),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만큼 흑인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레디시(Ledisi)와 뮤지크 소울차일드(Musiq Soulchild) 등 피처링 라인업이 호화롭기 이를 데 없다. 그런 탓인지 3월 17일 현재 이 앨범은 빌보드 앨범 차트 20위권 안에 드는 상업적인 성과마저 얻어내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이런 화려한 피처링은 한편으론 양날의 칼이 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게스트의 명성과 이름에 작품자체의 존재감이나 리더의 입지가 묻혀버리거나, 상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곡이 각자의 특징과 개성에 적합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게스트의 파워와 명성에 눌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 이도저도 아닌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외관은 화려한 잔치가 될지언정, 결과 자체는 무색해지게 되는데, 로버트 글래스퍼는 이런 점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최대한 음악적인 조화에만 신경을 쓰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이 앨범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함께 쌓아온 인간적인 관계 덕분에 그저 외양만 화려한 게스트 앨범처럼 만들어지지 않게 된 거 같습니다.
여기 함께 한 뮤지션들은 모두 음악계의 동료이면서 인간적으로도 친구입니다. 또한 이들은 음악적으로도 서로 아주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그 점이 이 앨범을 좀더 특별하게 만들어주었죠”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사실 이 앨범은 재즈 앨범이라기 보단 힙합 앨범에 더 가깝게 봐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전작에서 두 가지 다른 파트를 따로 구성해 어느 한쪽은 재즈 트리오 편성, 다른 한쪽은 익스피리먼트라는 파트로 힙합 재즈를 동시에 따로따로 다른 편성과 사운드를 통해 구현해내었던 로버트 글래스퍼는 이번에는 익스피리먼트 파트만을 따로 떼놓고 이것만을 확장시켜 하나의 앨범으로 만들었으며, 여기에서 각 트랙마다 모두 보컬 및 래퍼를 참여시켜 모든 음악을 만들어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작은 전작만큼 각 악기파트의 연주 비중이 높지 않으며, 로버트 글래스퍼 역시 어쿠스틱 피아노만큼이나 로즈 피아노와 키보드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특히 로버트 글래스퍼의 피아노는 피처링하고 있는 보컬리스트의 컴핑에 주력하거나, 즉흥연주를 보컬 사이사이 계속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지만, 녹음자체가 보컬의 위치를 보조하는 역할에서 머무르고 있는 편이다.
자신의 솔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대신, 키보드를 활용해 각 트랙에 걸맞는 사운드를 구현해내는 데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재즈 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앨범은 다소 당황스럽고 난감하게 비칠 소지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겠다.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이 앨범을 그저 대중적인 잣대에 맞추어 참여한 보컬리스트, 래퍼의 지명도와 위상에 기대어 만들고자 의도한 것으로만 판단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데, 실제 이 작품에 담긴 곡들은 결코 단편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사운드가 아니며 어떤 특정한 장르의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되는 면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몽고 산타마리아의 오리지널이며 이젠 스탠더드화된 명곡 ‘Afro Blue’ 나 샤데이가 불렀던 오리지널 ‘Cherish The Day’ 같은 앨범 초반부의 수록 곡들은 비교적 기존의 타 작품들과 별 차이가 없는 얌전하고 무드 있는 편에 속하지만 중, 후반부로 갈수록 보컬과 랩, 그리고 연주자들의 어프로치가 점차로 강렬해지며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드러머인 크리스 데이브와 베이스주자 데릭 호지는 전작과는 달리 재즈적인 리듬 메이킹을 거의 구사하지 않고 힙합의 틀 안에서 연주를 시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동일한 비트 하에서 악센트를 미묘하게 변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여기에 로버트 글래스퍼의 건반은 다른 악기들과 적잖은 거리감을 둔 상황에서 곡의 기본 코드를 토대로, 가끔은 그 밖에서 자유롭게 즉흥연주를 시도한다.
아마 이 앨범에서 가장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로 봐야 할 ‘Why Do We Try’ 같은 곡은 연주와 보컬 모두 철저하리만큼 힙합과 R&B 스타일에 기반한 즉흥연주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근래에 일반적으로 라디오에서 자주 들을 수 있는 차트용 히트 힙합 넘버와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다.
앨범 타이틀 넘버인 ‘Black Radio’ 역시 마찬가지. 이런 곡들에서 드럼과 베이스 피아노의 상호 교감이나 재즈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터플레이의 개념은 여기에선 발견되지 않는다. 스윙이나 비밥의 어법도 거의 발견할 수 없다. 아니 애당초 이 작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그 부분은 의도적으로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이 보일 정도다. 대신 피아노는 재즈적인 면이 분명 존재하는 가운데, 다른 방식의 어프로치로 임프로바이징을 시도하고 있으며, 그 외 악기들은 처음부터 미리 계산된 리듬의 틀 안에서 계속 연주를 해나간다. 평소 로버트 글래스퍼가 자신의 트리오와 함께 라이브에서 자주 연주하곤 하던 록 그룹 너바나의 ‘Smells Like Teen Spirit’ 같은 곡의 결과는 아마도 이 앨범에 수록된 네 곡의 리메이크 넘버 중 가장 독특하고 예상치 못했던 종류의 것인데, 관악주자인 캐쉬 벤자민이 자신의 목소리를 보코더를 통해 둔탁하면서도 묘하게 나른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면서 점차적으로 고조되는 키보드 사운드가 중독적이면서도 상당히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이 독특한 색깔의 힙합 재즈 앨범에 마지막을 장식한다.
로버트 글래스퍼는 지난 2월 말 즈음 미국 본토에서 이 앨범 발매 후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하면서 이번 앨범의 작업 동기와 의도에 대해 직접 밝힌 적이 있다. “지금 미국 대중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히트 곡들은 거의 비슷비슷한 형태의 곡들이 계속 반복되어 흘러나온다.
그리고 이 곡들은 특별히 언급할 가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음악들은 오로지 세일즈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금방 없어지거나 사라질 것이다. 이 앨범
앨범에 담긴 음악들은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내가 듣고 감명을 받아왔던 여러 장르의 요소들을 모두 한데 반영해 만들었는데, 여기엔 R&B, 힙합, 록과 같은 대중음악의 특징과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음악들이 어우러지는 기본적인 뼈대는 바로 재즈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이 글의 서두에 힙합과 재즈가 함께 만나는 작업이 이젠 새롭지 않다고 필자가 이야기했는데, 죄송하지만 말을 좀 바꾸어야겠다. 분명 힙합과 재즈는 이미 오래 전부터 서로간의 교류를 시도했었으며 작품 역시 지금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졌었다. 그러나 단지 감각과 단기적인 순발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로버트 글래스퍼 처럼 이렇게 양자를 모두 제대로,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와 그 근본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뮤지션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 내는 경우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
그에게 힙합은 단지 지금 트렌드의 중심에 있기에 한번 흉내내보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의 내부에 충분히 녹아있는 것이다. 그는 테렌스 블랜차드나 비첸테 아처같은 뮤지션들과 함께 재즈 넘버로 공연하는 것과 동시에, 디안젤로(D'Angelo)나 맥스웰(Maxwell), 모즈 데프와 비랄 같은 힙합 R&B 아티스트의 무대에 동등한 태도로 오른다.
그래서 이 앨범의 사운드는 앞서 언급했던 거장들의 힙합 재즈앨범과는 일견 비슷한 듯 하면서도 상당히 다른 질감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진정 문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표현하지 못하는 필자의 짧은 어휘력과 제한된 지면이 안타깝지만 그나마 확실히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로버트 글래스퍼로 인해 재즈와 힙합이 비로소 제대로 서로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퀸시 존스, 마일스 데이비스가 일찍이 90년대 초부터 바라봤던 힙합의 가능성이 혹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을까? 자! 이 앨범을 듣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
글: [MMJAZZ] 편집장 , 음악 칼럼니스트 김희준
 |
 |
 |
 |
|---|
2. Afro Blue (featuring Erykah Badu)
3. Cherish The Day (featuring Lalah Hathaway)
4. Always Shine (featuring Lupe Fiasco & Bilal)
5. Gonna Be Alright (F.T.B.) (featuring Ledisi)
6. Move Love (featuring KING)
7. Ah Yeah (featuring Musiq Soulchild & Chrisette Michele)
8. Consequence Of Jealousy (featuring Meshell Ndegeocello)
9. Why Do We Try (featuring Stokley Williams)
10. Black Radio (featuring yasiin bey (f/k/a Mos Def))
11. Letter to Hermoine (featuring Bilal)
12. Smells Like Teen Spirit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