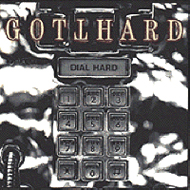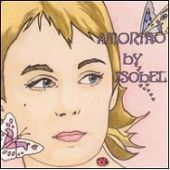|
|
 |
 |
 |
 |
|---|
벨 앤 세바스찬의 수줍은 히로인 이소벨 캠벨의 진정한 홀로서기 선언 ! 그녀의 야심에 찬 첫번째 솔로앨범 『Amorino』
* 한국팬들을 위해 특별히 선곡한 보너스 트랙 2곡 추가
2001년 겨울에 [I'm Waking Up To Us]라는 제목 의 새로운 EP가 벨 앤 세바스찬(Belle And Sebastian)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 그 중에서도 특히 보컬리스트로서의 물이 점점 제대로 오르고 있던 스튜어트 머독(Stuart Murdoch)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로 불리워진 타이틀 곡은, 자신의 오랜 연인이었으나 지금은 관계가 정리된 이소벨 캠벨(Isobel Campbell)을 겨 냥한, 다분히 공격적인 내용이라는 것이 자타공인의 암묵 속에 통용되었다. 그 거야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녀 이소벨이 그와 같은 벨 앤 세바스 찬 멤버였다는 데 있다. 당시 이 곡을 밴드와 함께 연주해야 했던 그녀의 심경 이란 게 당연 편했을 리가 없다. 실제로도 정말 힘들고 가슴 아픈 경험이었다는 게 그녀 자신의 고백이기도 했고.
이소벨은 결국 2003년에 그룹을 탈퇴한다. 그러나 이 결정은 사람들 생각처럼 단순히 인간관계의 불편함으로 인한 개인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궁극적인 탈퇴 이유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 [Amorino]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당시만 해도 벨 앤 세바스찬 외에 자신의 사이드 프로젝트 인 젠틀 웨이브스(Gentle Waves)도 함께 꾸리고 있던 그녀는 말한다: “동시에 두 풋볼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만약 같은 날에 각각의 팀 경기가 동시에 잡히기 라도 하면 어쩌란 말이죠?”
그리고 작년 10월, 벨 앤 세바스찬의 (미끈한) 새 앨 범 [Dear Catastrophe Waitress]와 이소벨 캠벨의 [Amorino]가 몹시 공교롭 게도 같은 시기에 발표되었다. 이소벨의 이번 앨범은 시기만이 아니라 여러 모 로 의미심장하다. 솔로 작업이 이미 처음이 아니었다고는 해도, 젠틀 웨이브스 라는 - 그녀의 표현을 빌면 - ‘보호막'이 필요했던 이제까지의 상황에 비해, 이 번 앨범은 확실하게 자신의 본명을 걸고 만든 진정한 출발점으로서 본격적인 홀로서기의 선언임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그리고 점점 능숙해지고 세련되어져가 는(이것도 나름대로의 소용이 있는 법이겠지만) 벨 앤 세바스찬이 어쩌면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잃고 있는 것을 본의 아니게 대신 거두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 도로, 이소벨만의 유니크한 방식으로 소화된 다양한 스타일들이 이번 [ Amorino]에 펼쳐지고 있다 - 굳이 덧붙이자면 머독의 'I'm Waking Up To Us'에 대한 그녀 자신의 친절한 답가('Monologue For An Old True Love')까지 포함하여.
문득 재킷을 보면 좀 고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소년들의 로망이라 할 그녀의 앳된 얼굴이 커다랗게 그려진 그림의 바탕은 커 다란 핑크. 그리고 그 위를 나비와 무당벌레가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명백한 장 식체로 ‘아모리노'라는 이탈리아어와 ‘이소벨'이라는 프랑스 풍의 이름이 쓰여 져 있다. 그러나 이토록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팬시 제품처럼 포장해놓은 데 다 른 저의나 농담 같은 건 없는 듯하다. 정말로 눈에 보이는 그대로가 그녀가 보 여주고 싶었던 그대로란 말. 하지만 이는 안 그래도 굳어진 그녀에 대한 선입견 을 얼마나 더 강화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될까나. 그녀의 그간의 이미지와 목소리 를 아는 사람들은 보나마나 소위 ‘트위(tweeness)'의 절정이라고 하기 딱 좋을 진대.
그러나 그녀의 최고(이자 유일한?) 강점은 많은 사 람들이 예단하는 것과는 달리 결코 목소리가 아니다. 점점 나아지는 그녀의 작 곡과 그것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표현해내는 프로듀서로서의 그녀의 자질 이야말로 이번 앨범에서 정말로 주목 받아야 할 지점이다. 거의 신기루 같은 경 지에 도전하는 그녀 특유의 그 에테르 같은 속삭임이라면 그 어떤 곡도 60년대 프렌치 시네마 팝처럼 만들어버리고 말 것만 같지만(물론 정말 60년대 프렌치 시네마테크 영화음악 같은 면모는 그녀 자신도 영화음악과 프랑스 문화 전반에 대한 애착을 숨기지 않은 바 이소벨의 음악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임 에 틀림없긴 하다), 실제로 [Amorino]에서 시도되고 있는 스타일은 결코 고정 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이 이 앨범의 가장 큰 미덕이다 - 즉, 그토록 변함없는 아이덴티컬한 목소리로 그토록 컨벤셔널하면서도 풍부한 표현을 해보이고 있 다는 것이. 그녀에게 익숙한 포크를 기조로 한 챔버 팝 외에도 보사노바나 재즈 , 딕시랜드 스타일의 캬바레, 영화음악 스타일의 연주곡 소품 등을 이 앨범에서 한꺼번에 듣고 있자면, 맘만 먹으면 데스 메틀도 할 수 있다며 ‘f'로 시작하는 상서롭지 못한 말도 발끈 내뱉은 적이 있는 롤링 스톤 지와의 그녀의 인터뷰도 농담이 아니라 정말 현실로 만나보고 싶다는 바램마저 갖게 되는 것이다.
커트 코베인이 좋아했던 밴드로 유명한 배슬린즈( Vaselines) 출신의 유진 켈리('Time Is Just The Same' 에서의 보컬 듀 엣), 포티스헤드(Portishead)의 기타리스트 에이드리언 어틀리('This Land Flows With Milk' 에서의 테레민 연주), 그리고 스크리밍 트리즈(Screaming Trees)와 퀸즈 오브 더 스톤 에이지(Queens Of The Stone Age) 출신의 마크 래너건(그러나 이번 앨범에는 실리지 않은 'Why Does My Head Hurt So?'의 보컬 버전에서만) 등 다소 의외의 게스트들과 함께 1년만에 완성한 [ Amorino]는 이소벨의 말에 따르면 제목과 같은 한 이탈리아 단어에서 촉발된 개인적 의문이 결국은 앨범을 규정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랑을 뜻하는 ‘ amor(e)'의 변형인 이 단어에서 보다시피 그녀가 이 앨범에 담은 대전제는 역 시 사랑이다. 이 역시 그녀의 이미지로 볼 때 전술한 핑크빛 재킷과 마찬가지로 너무 전형적이지 않느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녀가 말하고 싶은 사랑은 결코 달콤하거나 낭만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는 천진난만하지만(-하기에) 그 속에 잔혹함과 비극을 숨기고 있는 어린이 동요 너저리 라임(Nursery Rhyme)처럼, 그녀가 말하고 싶은 사랑이란 핑크 빛 속의 블루, 잔디밭 속의 사 금파리 같은 어떤 날카로움이라는 하나의 역설이다. 바로, 이소벨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선입견이 그런 것처럼.
…혹은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떤가. 그녀는 반문한다. “요새 음악계에서 사랑 어쩌구 하면 좀 구식 같아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사랑에 대해서 쓰지 말란 법이 어디 있나요? 사람들은 언제나 사랑이 부족하거나 사랑 에 굶주려 있는데 말이죠.” 지당하신 말씀.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이토록 당연한 말도 그녀의 속삭임을 거치면 우리 가슴은 문득 두근거린다는 것이다. 마치 저 분홍 재킷 속의 아름다운 나비들이 배가 아니라 가슴 속에서 퍼덕이듯 (with butterflies in our hearts). 글쎄, 어찌 보면 이것도 그녀만이 일으킬 수 있는 일종의 나비 효과인 걸까.
[글: 성문영]
 |
 |
 |
 |
|---|
2. The Breeze Whispered Your Name
3. Monologue For An Old True Love
4. October's Sky
5. The Cat's Pyjamas
6. Why Does My Head Hurt So ?
7. Johnny Come Home
8. Poor Butterfly
9. Love For Tomorrow
10. There Is No Greater Gold
11. This Land Floods With Milk
12. Song For Baby
13. Time Is Just The Same
14. A Million Arms To Hold You (Bonus)
15. The Cat's Pyjamas (Alternative Version)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