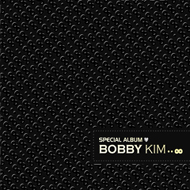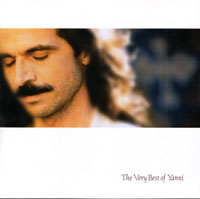|
|
 |
 |
 |
 |
|---|
낭만적 우울증과 폐쇄적 연민에 시달리는 도시의 보헤미안들을 사로잡았던
케렌 앤(KEREN ANN)의 2011년 새 앨범 「101」
이중성, 찰나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음악과 가사를 대비시킨 케렌 앤의 2011년 새 앨범 [101]의 음악은 묘한 울림을 주는 스산한 아름다움으로 가볍지만 격렬하다.
보다 더 완고하게 자신의 음악세계를 추구한 4년만의 새 앨범
KEREN ANN [101]
아직도 [Not Going Anywhere]를 케렌 앤(Keren Ann) 음악의 전부로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 잊는 것이 좋다. 2004년 가을쯤 내한했던 케렌 앤은 프랑스에서 한참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의 광고필름에서 자신의 노래를 사용했다는 것에 굉장히 재미있어 했다. 맞다. 그건 수천만곡 가운데 집어든 한 곡이 우연히 CF에 사용되었던 것일 뿐이다. 물론 그 이후 [Not Going Anywhere]를 담은 앨범 「Not Going Anywhere」(2003) 역시 사랑받았다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 무렵은 케렌 앤의 음악 이력에서 정점을 찍었을 때였으니까.
케렌 앤은 2000년에 발표한 첫 앨범 「La Biographie De Luka Philipsen」과 2년 뒤에 발표하는 두 번째 앨범 「La Disparition」을 프랑스어로 노래했다. 프랑스 태생은 아니었지만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케렌 앤은 프렌치 팝의 미래였다. 그런 그녀가 영어를 사용해 자신의 음악이 가진 정서의 공감대를 확장했기 때문에 모던 포크의 미래이기도 했다. 바로 그 앨범이 「Not Going Anywhere」였다. 그윽하지만 무심한 보컬, 그에 맞춰 무심한 듯 연주하는 어쿠스틱 기타는 듣는이를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다.
하지만 [Not Going Anywhere]는 케렌 앤의 이후 음악에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묘한 걸림돌이 되었다. 팬들이 사랑한 건 프렌치팝이 아니라 글로벌한 모던 포크 스타일이었다.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스토리텔링은 그 어떤 앨범보다 뚜렷했던, 세 여인의 이야기를 그린 컨셉트 앨범 「Nolita」(2004)는 전작만큼 뜨거운 반응을 얻지는 못했다. 음악은 밝지 않았지만 어둡지도 않았다. 여전히 묘한 매력을 주는 무덤덤한 연주와 보컬을 담고 있었다. 분명한 건, 그 속에 뚜렷한 이야기도 있었고 그녀가 이야기한 대로 여성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도 담았다. 팬들이 원한 건 영화 같은 스토리 라인이 아니라 단 한곡이어도 좋을 [Not Going Anywhere]와 유사한 노래였다. 그녀가 자신의 음악을 다른 방향에서 풀어내면서 음악세계를 확장시켰지만, 성공은 이어지지 않았다.
「Nolita」에서 3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케렌 앤은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새 앨범 「Keren Ann」에 보다 더 내밀한 이야기를 담으려는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고 있었다. 케렌 앤은 이번 앨범을 위해 무려 여섯 나라의 스튜디오를 오가며 작업했다. 파리, 레이캬비크, 뉴욕, 텔 아비브, 아비뇽, 로스앤젤레스의 스튜디오에서 만들어낸 음악들이 각 나라의 정서나 서정을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기존의 음악과 비교하면 조금 달라진 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디스토션을 많이 첨가했고, 예상을 깨는 코러스, 그리고 낯선 효과음을 만들어낸 컴퓨터 프로그래밍, 여기에 아주 약간 가미한 이국 정서까지 단순한 듯 복잡한 듯한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담아냈다. 특히 기발한 사운드 엔지니어링이 돋보이는 [Between The Flatland And The Caspian Sea]와 케렌 앤의 음악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묘한 소리가 이어지는 연주곡이자 앨범의 마지막 트랙 [Caspia]는 무척 달라진 케렌 앤의 정서를 대변할만한 곡이었다.
이렇게 케렌 앤의 과거를 되돌아보면 오히려 가장 낯설었던 곡은 [Not Going Anywhere]였다. 당시 작곡 파트너 벵자멩 비올레(Benjamin Biolay)의 영향도 많이 있었을 게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케렌 앤은 싱어이자, 송라이터, 프로듀서, 엔지니어까지 모두 담당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다. 이후 작업에서 믹싱을 제외한 모든 음악작업을 직접 담당한 건 자기의 음악을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스산한 아름다움, 공허하면서도 뭔지 모를 희열, 바람에 떠다니는 부유물처럼 중력이나 무게를 느낄 수 없는 자유로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으로 가라앉음, 이 모든 것이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여기에서 4년. 케렌 앤의 디스코그래피를 통틀어 가장 오랜만에 만나는 새 앨범이다. 「101」이라는 숫자를 제목으로 삼은 특별한 이유를 찾아내고 싶어지게 만든다. 지난 앨범 「Keren Ann」과 이번 앨범 「101」 사이에 케렌 앤은 여러 작업을 한 바 있는데,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작업은 영화 'Thelma, Louise et Chantal'의 사운드트랙 작업이다. 다른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했지만 케렌 앤이 핵심 아티스트로 참여한 이 사운드트랙에서 벵자멩 비올레와 함께 노래하기도 했고, 부드러운 포크팝 트랙 [Nothing Moves Her Anymore 1]을 선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작업이 이번 새 앨범 「101」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 사운드트랙과 자신의 앨범을 명확하게 구분짓기라도 한 것처럼 이번 앨범은 그동안 만들었던 작품들과 비교해도 무척 색다른 내용을 전하고 있다.
음악은 지난 앨범처럼 기묘함을 간직하면서도 사운드는 좀 더 복잡해진 대신 디스토션을 비롯한 이펙트로 강렬한 소리를 만들어냈던 소리들을 부드럽게 다듬었다. 부드러워진 대신 스타일은 더욱 다양해졌다. 찰랑거리는 키보드가 이끄는 앨범의 첫 곡 [My Name Is Trouble]은 곧바로 그 변화를 드러낸다.
하지만 이번 앨범에서 더 중요한 건 각 노래에 담은 특별한 시선이다. 지금까지 부유하고 되돌아보고 생각에 잠기며 가볍게 흔들리던 것과 달리 세상 사람들이 흔들리는 순간을 포착해내고 있다. 앨범의 첫 곡 [My Name Is Trouble]을 다시 거론하면,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있지만 그 와중에서 스쳐지나가듯 공허함과 불안한 과거의 모습을 동시에 표현하는 식이다.
그래서 이전의 케렌 앤 앨범 속에서 우리를 공감하게 만들었던 아름다운 슬픔, 또는 스산한 아름다움이 이번 앨범에서는 독특하게 비틀린 채 다가온다. 미래를 장담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당신을 원한다는 이중적인 심경을 그린 [Run With You]나 화려하고 화사함 뒤에 숨은 긴장을 느끼게 하는 [All The Beautiful Girls]처럼 순간적인 이중성을 포착해낸다. 앞서 이야기했듯, 이번에는 케렌 앤은 상황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묘사할 뿐이다. 영화나 그림만큼 강렬한 묘사가 돋보이는 곡은 [Blood On My Shoes]이다. 기묘한 죽음을 다루고 있는데, 음악은 지극히 평온하다. [Sugar Mama]도 그렇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사랑과 삶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의 이야기가 완전히 배제한 건 아니다. [Song From A Tour Bus]는 인기를 누리는 뮤지션이 투어 버스에서 느끼는 순간의 공허함을 다루고 있다. 어쩌면 자신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 곡에서도 마치 영화의 내레이션처럼 여러 생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케렌 앤의 새 앨범 「101」은 이중성, 찰나의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묘사하기 위해 음악과 가사를 대비시켰다. [Strange Weather]는 음악과 가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곡이다. 금방이라도 눈물을 뚝뚝 흘릴 것처럼 슬픈 정서로 가득찬 이 노래는 한 남자를 만나 사랑하고 가정도 꾸리지만, 자신의 꿈과 상처입은 마음을 숨겨야할 거라는 우울한 내용이 극적인 연주와 보컬 사이에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앨범 타이틀 곡 [101]이다. 앨범의 마지막 곡 [101]은 이번 앨범에서 보여주려 했던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삶과 찰나의 생각과 이중성을 101부터 시작해 1에 이르기까지 의식의 흐름처럼 툭툭 끊으면서도 이어간다. "101층, 100일의 충만한 나날들, 99 퍼센트…" 101층에서 시작한 생각은 마지막 1에 이르면 "신"에 도달한다. 수많은 생각, 수많은 역사, 수많은 상념, 수많은 시와 사진,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신에 이르기까지 그녀가 생각하는 것들이 툭툭 떨어져내린다.
그러고 보면, 이번 앨범은 뚜렷하지 않으면서도 뚜렷하다. 모든 곡이 감정의 이중성을 드러내는 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Not Going Anywhere]를 기대했던 팬에게는 아쉬운 앨범일지 모르지만, 그녀의 음악이 차분한 서정성을 추구하던 시기는 한참 전에 지났다. 「101」은 더 완고하고 명확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케렌 앤의 음악세계를 드러낸다. 날카롭게 꽂히는 비수이기도 하고, 부드러운 손길이기도 하다. 묘한 울림을 주는 케렌 앤의 음악은 이번에도 가볍지만 격렬하게 흔든다.
2011년 3월. 한경석
 |
 |
 |
 |
|---|
2. Run With You
3. All The Beautiful Girls
4. Sugar Mama
5. She Won't Trade It For Nothing
6. You Were On Fire
7. Blood On My Hands
8. Song From A Tour Bus
9. Strange Weather
10. 10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