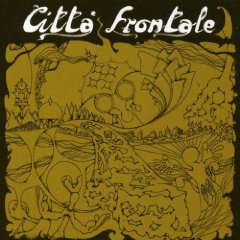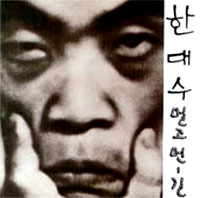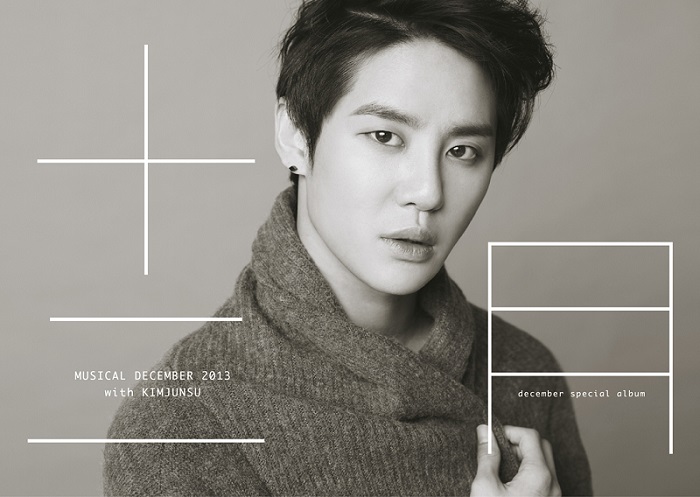|
 |
 |
 |
|---|
로랑 코르샤 <시네마>
Laurent Korcia - Cinema
1983년 파가니니 콩쿨에서 1위 없는 2위로 우승하며, 화려하게 등장한 프렌치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의 EMI 데뷔음반 <시네마>
<티파니에서 아침을>, <시네마 천국>, <대부>, <여인의 향기>, <뜨거운 것이 좋아>, <쉰들러 리스트>, 화양연화>, <모던 타임즈>, <미션 임파서블> 등 '불의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가 쏟아내는 감동의 영화음악들… 이 음반은 영화음악 100주년을 기념하는 로랑 코르샤의 영화에 대한 헌정앨범이다.
코르샤는 피플紙가 선정한 <현존하는 가장 섹시한 남성>에 뽑히기도 했는데, 프랑스의 국민배우 제라르 드 파르디유의 딸인 줄리 드 파르디유와 7년간 열애 끝에 지난해 결별했다는 후문이 전한다.
얼음을 가르듯, 불을 지피듯, 바이올린의 도발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서 바이올린을 향해 불꽃을 던지는 남자. EMI에서의 첫 데뷔 앨범인 ‘Cinema’를 발매한 프랑스의 바이올리니스트 로랑 코르샤이다. 코르샤는 ‘피플’지가 마련한 특집기사 ‘현존하는 가장 섹시한 남자’ A-Z에 선정된 바 있다.
매력적인 외모는 그렇다 치고 실력은? 그의 외모 이상이다. 이미 낙소스•RCA•나이브 등에서 앨범을 발표해 왔다. 1998년 에르네스트 쇼송의 ‘시곡’(Naxos)을 시작으로 이자이, 바르토크(이상 Lyrinx), ‘치간느’ ‘Nos Souvenirs’ ‘Une Priere’(이상 RCA), ‘Danses’, 바르토크, ‘Double Jeux’ ‘Limited Edition’(이상 Naive)에 이르기까지 코르샤는 10장의 앨범을 발매한 베테랑이다. 혹여 외모만 빛나는 그저 그런 아티스트로 속아서는 안 될 일이다.
코르샤는 프랑코 벨기에 악파의 빛나는 전통을 잇고 있는 연주자다. 계보를 보자. 그는 파리 고등음악원에서 미셀 오클레르에게 배웠다. 오클레르의 스승은 자크 티보나 조르주 에네스쿠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인지 코르샤의 경력을 보면 자크 티보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조르주 에네스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파가니니 콩쿠르나 지노 프란체스카티 콩쿠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의 소유자다.
코르샤는 공연에서 바흐에서 현대곡까지 매우 폭넓은 레퍼토리를 연주한다. 이자이의 무반주 소나타 전곡이나 한스 베르너 헨체의 소나타를 연주하기도 한다. 안무가인 안네 테레사 데 케르스매커의 발레 작품에 참여하기도 하고 프랑스 생 드니 페스티벌에서는 브뤼노 쿨레의 ‘스타바트 마테르’를 초연하기도 하는 등 활동의 스펙트럼이 넓다.
코르샤가 연주하는 1719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는 루이뷔통 그룹에서 대여해준 것이라 한다.
“코르샤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당당한 스타일, 기교, 카리스마, 게다가 아이디어, 매력까지”(르 몽드)
이 평에는 약간 들뜬 과장이 섞여 있다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앨범 ‘Cinema’의 연주는 매력적이다. 제목대로 음악이 영화에 등장한지 10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띠고 기획되었으며, 비발디나 거슈윈, 엔니오 모리코네, 존 윌리엄스 등의 갖가지 곡들이 담겼다. ‘티파니에서 아침을’에 삽입된 헨리 맨시니의 ‘문 리버’, ‘대부’에 쓰인 니노 로타의 ‘Speak Softly Love’, ‘뜨거운 것이 좋아’에 쓰인 제라도 마토스 로드리게스의 ‘라 쿰파르시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 쓰인 ‘스마일’ 등등. 스무 트랙에 이르는 작품들을 코르샤는 편성을 달리해 가며 연주하고 있다. 오케스트라로는 로켄 유러피언 체임버가 참가했다.
그렇다고 이번 앨범을 그저 그런 크로스오버 앨범으로 지나치기에는 너무 아깝다. 레퍼토리가 정통 클래식은 아니지만 코르샤는 모두 어쿠스틱으로만 연주하고 있다. 전자악기는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 코르샤는 바이올린이 표현할 수 있는 미학의 틀을 넓혀 놓았다. 굳이 표현하자면 ‘영화 주제의 고전음악적 변주’라고나 할까.
맛깔스럽지만 클래식의 선을 넘지 않는 품위
백문이 불여일청. 음반을 플레이어에 거니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의 ‘시네마 천국’ 테마 음악이 흘러나온다. 순수하던 시절의 추억, 가슴 벅찬 키스 장면들의 시퀀스는 누구의 가슴속에나 영원히 소용돌이치는 노스탤지어로 남아있을 것이다. 코르샤의 바이올린은 그 벅찬 순간의 한 지점으로 듣는 이를 데려간다. 추억으로 가는 그 속도는 약간 빨라 머리칼이 흩날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다.
1959년의 영화 ‘포기와 베스’에 나온 ‘It Ain't necessarily so'는 야샤 하이페츠가 편곡했다. 가스펠과 재즈, 아방 가르드가 혼재하는 거슈윈의 천재적인 음악을 코르시아는 끈끈하면서도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연주했다.
바이올리니스트가 주인공인 구스타프 몰란더의 1936년작 ‘인터메조’에 삽입된 프로보스트의 ‘인터메조’는 모든 대사를 음악으로 전달하던 시절의 멋이 풍겨 나온다. 때로 음악은 그 어떤 미묘한 대사보다도 명쾌하게 뉘앙스를 전달한다.
다음 곡은 이 음반의 백미인 ‘미션 임파서블’이다. 사실 감상하기 전부터 나는 영화의 리메이크와 함께 전자음악에서 테크노로 진화한 이 유니크한 음악을 어떻게 표현했을지 몹시 궁금했다. 과연 그는 아코디온을 참여시켜 그루브감을 살렸다. 가슴에 와 꽂히는 코르샤의 연주는 도발적이다. 아찔한 휘발성이 있다.
2001년의 영화 ‘어페어 오브 더 넥클리스’에 쓰인 비발디의 ‘사계’ 중 ‘여름’은 자극적인 연주가 넘쳐나는 요즘의 시각에서 들으면 상대적으로 점잖지만, 코르샤는 날카로움을 잃지 않는다.
중간은 없는 극단을 그린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키카’에 대비가 뚜렷한 그라나도스의 ‘스페인 춤곡’ 5번을 쓴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코르샤의 연주는 절벽을 굴러 떨어지는 바위처럼 더욱 급박하다.
자보 브리트만 감독의 ‘내 인생의 남자’에 등장한 ‘Tribulations'는 코르샤가 작곡한 탱고 곡이다. 어두운 가운데 이따금 빛나는 아코디온과 어우러지는 코르샤의 바이올린에는 어쩐지 마초적인 운치가 있다. 아첨하지 않는 남자만의 세계가 느껴진다.
‘박쥐’의 박찬욱 감독도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블랙 유머의 거장 베르트랑 블리에 감독의 ‘남자들’(1974년작)의 동명 타이틀곡은 재즈 바이올린의 거장 스테판 그라펠리의 작품을 코르샤가 편곡한 것이다. 참 인상적인 곡이다. 아무것도 아닌 무의 상태에서 슬쩍 나타나 점차 그 존재를 넓혀가고 굴곡을 형성한다. 정상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더니, 이내 사라진다. 인생처럼, 사랑처럼.
‘티파니에서 아침을’에 쓰인 헨리 맨시니의 ‘문 리버’는 마치 유서프 카쉬가 찍은 오드리 헵번의 사진같이 찰나를 스친다. 곡이 사라진 후 더욱 그 존재감이 커진다.
이어지는 찰리 채플린의 두 곡 ‘Smile'(모던 타임즈, 1936)과 ’Weeping Willos'(뉴욕의 왕, 1957)에서 코르샤는 채플린의 양면인 해맑음과 풍자를 동시에 노정하고 있다.
존 윌리엄스가 작곡한 스필버그 감독의 ‘쉰들러 리스트’ 테마는 원곡에서 이차크 펄만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음악’처럼 연주했다면, 코르샤는 좀 더 곡을 닦아 광을 내고 삶의 희망을 불어넣어 연주하고 있다.
일본인 어머니와 스웨덴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양쪽 청력을 다 잃은 채 연주활동을 한 천재 피아니스트 후지코 헤밍을 위해 작곡한 ‘후지코의 왈츠’에는 후지코 헤밍이 직접 참여하여 감동의 연주를 들려주고 있다.
왕가위 감독의 ‘화양연화’에 쓰인 우메바야시의 ‘유메지의 테마’에서 코르샤는 격정 뒤의 애처로운 고독감을 먹먹하게 그리고 있다. 시벨리우스의 ‘슬픈 왈츠’보다 더 슬픈 왈츠가 이 곡이 아닐까.
이어지는 곡은 ‘대부’의 테마 음악으로 니노 로타가 작곡한 ‘Speak Softly, Love’이다. 소프라노가 중요한 아리아를 부르듯 바이올린의 설득력이 색다른 맛이 있다.
‘여인의 향기’에서 나온 ‘Por Una Cabeza'와 ’뜨거운 것이 좋아‘에 나온 ’La Cumparsita' 등 두 곡의 탱고 곡은 마치 원래 한 곡이었던 것처럼 이어진다.
‘포기와 베스’에 쓰인 거슈윈의 곡이 다시 나온다. ‘Summertime’. 끝없는 여름 햇살처럼, 더위에 한 풀 꺾인 빌리 할리데이의 한숨처럼 곡은 양지에서 음지로 이동한다.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이노센트’의 주제곡을 작곡한 프랑코 마니노는 비스콘티 감독의 ‘베니스에서의 죽음’에서도 음악을 담당했다. 거기에 사용된 말러 교향곡 5번의 ‘아다지에토’ 처럼 ‘이노센트’은 고요한 가운데 아픔이 느껴지는 곡의 분위기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극적이다.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영화 ‘게임의 규칙’에 삽입되었다). 김연아 선수의 멋진 연기로 인해 이제는 너무나 잘 알려진 ‘국민 클래식’이 되었다. 이제 이 곡이 식상할 무렵 찾아온 코르시아의 연주는 시퍼런 바다에서 막 건져낸 다랑어 같은 생명력이 넘친다. 잡힌 뒤에도 갑판 위를 튀어 오르는 참치와 그 비늘에 반사되는 눈부신 햇빛이 떠오른다.
스무 번째 트랙은 빌 에반스와 마일즈 데이비스의 재즈 넘버로 영원히 각인되어 있는 ‘Someday My Prince Will Come’(1937년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이다. 마지막 곡이지만 희망과 동경으로 열려 있다. 프랑스 출신의 보컬리스트 카미유(Camille)의 목소리는 그 동경에 색칠을 하고 방점을 찍는다.
미처 몰랐던 우아한 세계로의 초대
음반을 다 듣고 나면 귓전에는 코르샤의 바이올린이 새긴 여적이 남는다. 마치 날카로운 첫 키스가 쉽사리 잊혀지지 않는 것과 같다. 코르샤는 그동안 식상했다고 여겨진, 바이올린의 아름다움에 먼지를 털고 우리 앞에 새롭게 내밀어 보였다. 추억과 망각의 길목에 서 있는 영화음악이라는 소재는 그 촉매제로 작용했다.
이쯤 되면 코르샤의 연주를 직접 듣고 싶다는 욕망으로 이어진다. 나는 코르샤가 어쩌면 침체기에 있는 클래식 음악계에 크나큰 활력소가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이젤 케네디 같은 기벽 없이도, 다비드 가렛의 통속성이 없이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코르샤는 우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글 류태형(월간 ‘객석’ 편집장)
 |
 |
 |
 |
|---|
2. It Ain't Necessarily So (George Gershwin: Porgy & Bess 포기와 베스)
3. Intermezzo (Heinz Provost: Intermezzo 인터메조)
4. Mission Impossible (Lalo Shifrin: Mission: Impossible 미션 임파서블)
5. L' Estate (Summer) III (Vivaldi: The Affair of the Necklace 어페어 오브 더 넥클리스)
6. Dansas Espanolas No:5 (by Enrique Granados: Kika 키카)
7. Tribulations, Sur Les Themes (Laurent Korcia: 내 인생의 남자)
8. Les Valseuses (Stephane Grapelli: Les Valseuses/Going Places 남자들, 왈츠를 추는 사람들)
9. Moon River (Henry Mancini: Breakfast at Tiffany's 티파니에서 아침을)
10. Smile (Charles Chaplin: Modern Times 모던 타임즈)
11. Weeping Willows (Charles Chaplin: A King in New York 뉴욕의 왕)
12. Schindler's List (John Williams: Schindler's List 쉰들러 리스트)
13. Fuzjko's Waltz (Laurent Korcia)
14. Yumeji's Theme (In The Mood For Love) (Shigeru Umebayashi: In the Mood for Love 화양연화)
15. Speak Softly Love (Nino Rota: The Godfather 대부)
16. Por Una Cabeza/ La Cumparsita Medley (Carlos Gardel: Scent of a Woman / Gerardo Matos Rodriguez: Some Like it Hot 여인의 향기/뜨거운 것이 좋아)
17. Summertime (George Gershwin: Porgy & Bess 포기와 베스)
18. L'innocente (Franco Mannino: L’Innocente/The innocent 이노센트)
19. Danse Macabre (Camille Saint Saens: The Rules of the Game 게임의 규칙)
20. Someday My Prince Will Come (Morey & Churchill Film: Snow White 백설공주)
 |
 |
 |
 |
|---|